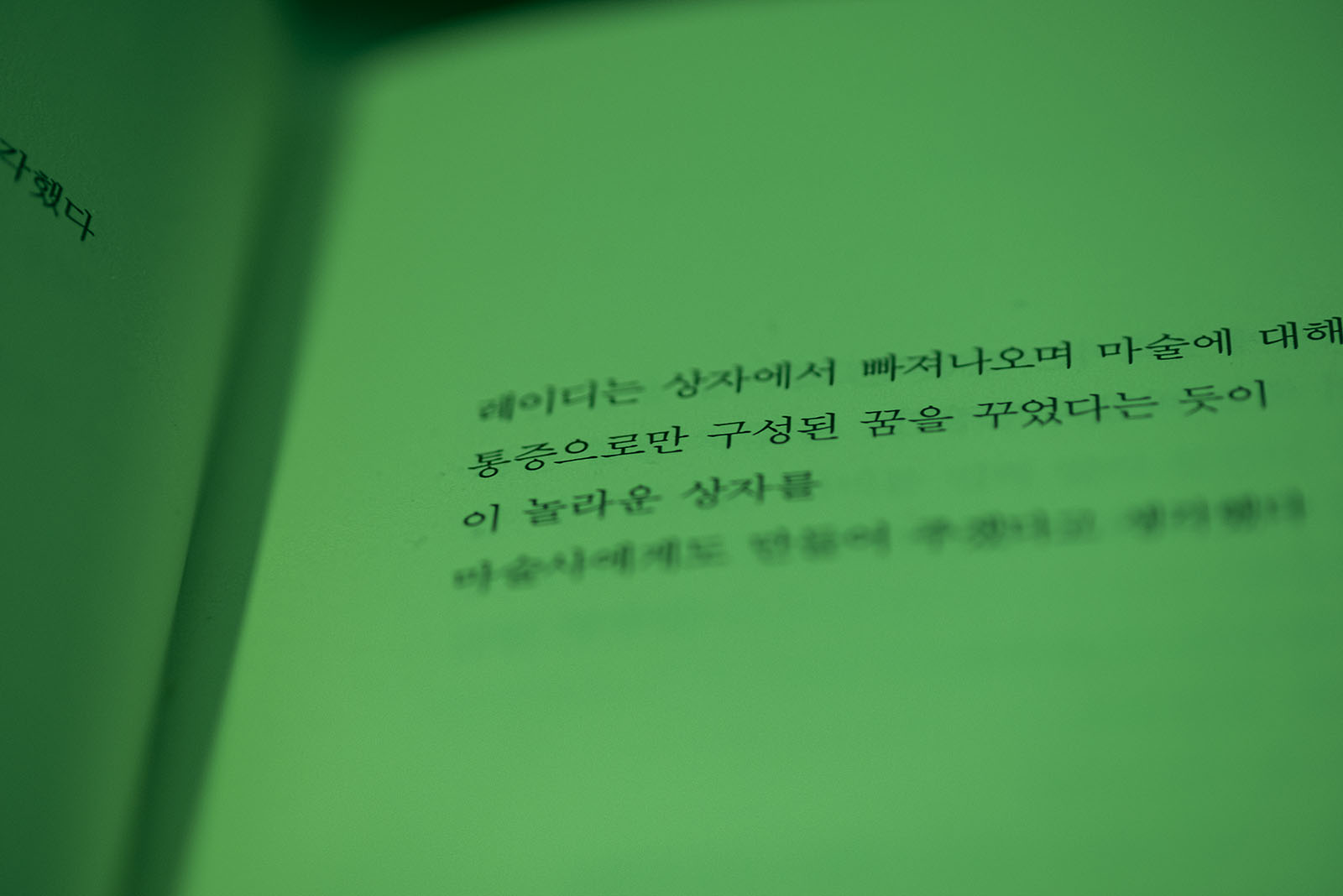마술의 주관자는 마술사이다. 대개 남자이다. 하지만 마술의 유형에 따라 진행 보조자가 함께 하기도 한다. 보통은 보조자를 미녀라고 부른다. 미모의 여성이 맡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마술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은 마술사에게로 모인다. 시인 유계영의 시선은 그렇질 않다. 그의 시 「지그재그」에서 마술을 앞에둔 시인의 시선은 진행 보조자에게로 가 있다. 그를 미녀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시인은 그 보조자를 레이디라고 부른다. 미녀라는 말은 여성을 미모로 소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부른다. 아마도 그 느낌을 지운 말을 쓰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또 하나, 미녀는 마술사에게 복속되어 있는 존재이다. 시인에겐 그런 예속된 위치를 벗어나 스스로 사고하는 존재가 필요했을 것이며 그 존재에겐 다른 명칭을 부여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마도 레이디가 그에 부응한 명칭으로 생각된다. 시는 이렇게 시작된다.
레이디는 상자에서 빠져나오며 마술에 대해 생각했다
—유계영, 「지그재그」 부분
이제 생각은 마술사만의 것이 아니라 레이디의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시는 시가 말하고 있는 마술에 대해 몇 가지 짐작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 중의 하나는 이 마술이 상자를 이용한 마술이란 것이다. “잘려 나간 팔다리가 식어 가는 동안에도/몸에서는 부드러운 털이 자라났지”라는 구절은 이것이 절단 마술이란 짐작을 가능하게 해준다. 부드러운 털이라고 했으니 마술의 진행을 다 알고 있는 레이디에겐 털이 곤두서는 긴장은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나는 아프고 너는 지켜보기만 했는데/너를 좋아해서 웃어만 지는 얼굴”은 항상 관객들을 향해 미소를 잃지 않는 레이디의 얼굴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절단될 상자 속에 들어가 있을 때의 자신이 마치 식물같은 느낌이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아마도 식물이라면 곧 잘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식물이 될테니 “미치기 직전의 상태로 끝까지 살아가는 식물”과 같았을 것이다.
시는 마술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모자 속의 토끼/사과 속의 코끼리 같은/순진한 준비물과/대괄호가 많은 아이들의 말속에서/레이디는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했다”는 구절이 그 사실을 알려준다. 대괄호는 발음을 알려줄 때가 많으니 “대괄호가 많은 아이들의 말”은 마술을 보며 비명이나 환호를 지르는 아이들의 소리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마술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사람이 절단이 되면서 두 동강이 나는데도 그 둘이 제각각 논다는 점일 것이다. 나는 그 상황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무릎이/명상의 밧줄처럼 잘 땋여/거기 남았다”는 구절로 이해했다. 마술에선 몸이 둘로 나뉘었는데도 무릎 이하의 절반이 마치 계속 연결이라도 되어 있는 듯 분리된 상자에 남아서 움직인다. 시인은 그 상황을 “우린 모두 그가 다녀온 공간을 위로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은 위로라기보다 마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감탄일 것이다.
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
레이디는 상자에서 빠져나오며 마술에 대해 생각했다
통증으로만 구성된 꿈을 꾸었다는 듯이
이 놀라운 상자를
마술사에게도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했다
—유계영, 「지그재그」 부분
나는 이 부분을 마술사가 아니라 레이디의 입장에서 본 마술의 세상이라 생각했다. 마술사의 상자는 사람을 절단하지만 사실 그 절단은 내막을 알 수 없을 뿐, 실체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마술의 통증은 실체가 없는 통증이다. 시인은, 말을 바꾸자면 레이디는, 마술을 “통증으로만 구성된 꿈”이라고 말한다.
현실적으로는 통증은 통증의 실체가 있다. 만약 마술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면 몸의 절단은 엄청난 고통을 가져온다. 그것이 통증의 실체이다. 하지만 마술에선 통증만 있고 통증의 실체는 없다. 시인이 마술을 “통증으로만 구성된 꿈”이라고 한 연유일 것이다.
현실은 마술이 아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현실마저 마술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때 한 교수의 저서가 널리 알려지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이 유행을 탔다. 하지만 왜 아픈 지, 청춘이 갖는 통증의 실체는 명확히 파악이 되질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청춘의 통증은 마술 같은 통증이었다. 실체는 없고 통증만 있는 듯했다는 뜻이다.
시인은 레이디의 시선을 빌려 묻는 듯하다. 혹시 우리들이 통증을 바라볼 때 마치 마술을 보고 있을 때처럼 통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일까 하고. “통증으로만 구성된 꿈”은 마술의 상자에서만 나온다. 그런 상자는 사실 있을 수가 없다. 시인은 “이 놀라운 상자를/마술사에게도 만들어주겠다고 생각했다”고 시를 마무리짓는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자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그런 상자를 마술사에게 만들어주겠다고 생각한 것일까. 레이디의 결론은 사실은 그런 상자는 없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시의 제목인 지그재그는 똑바로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다. 좌우로 비틀거리는 걸음이다. 때로 세상의 진실이 휘청거리는 걸음에서 비로소 보인다. 나는 시인이 마술을 보며 휘청거렸다고 생각했다. 통증의 실체는 외면한채 “통증으로만 구성된 꿈”을 만들어내고 있는 마술사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아닐까. 그것은 시선을 레이디에게 돌렸을 때만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했을 것이다. 시를 다 읽고 났을 때 시인이 속삭이는 듯했다. 항상 조심해. 마술의 주관자는 세상을 은폐해.
(인용한 시는 유계영 시집 『온갖 것들의 낮』, 민음사, 2015에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