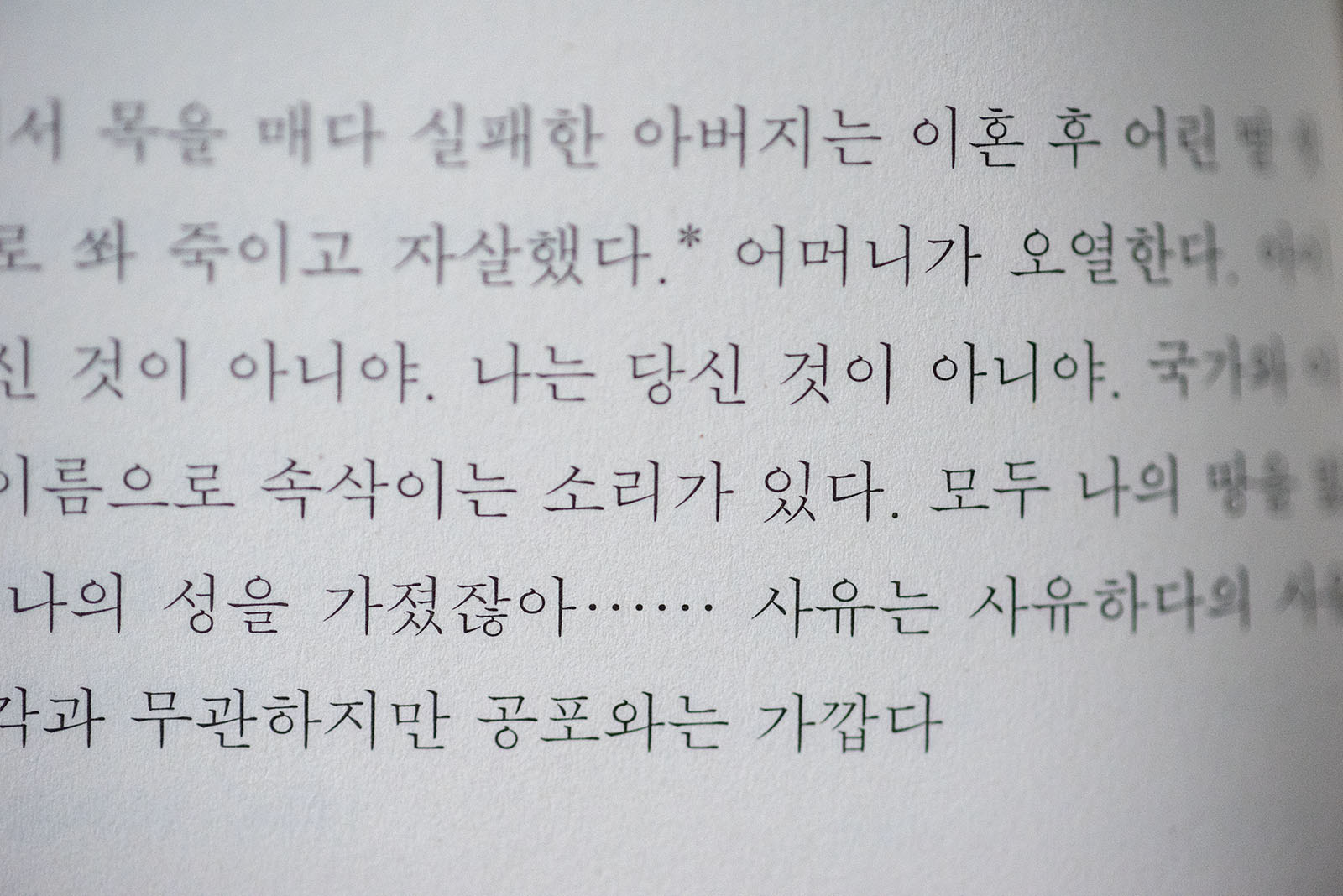
시인 진수미의 시 「무섭다」는 여자들이 살아가기에 무서운 세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시인이 전하는 그 무서운 세상에선 “차고에서 목을 매다 실패한 아버지”가 “이혼 후 어린 딸 셋을 총으로 쏴 죽이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무섭다’는 말 속에 요약되어 있는 이러한 세상은 카티아 맥과이어와 에이프릴 헤이즈가 감독한 다큐멘터리 영화 <뼈아픈 진실(Home Truth)>의 내용을 이룬다. 다큐멘터리의 제목과 감독 이름은 시인이 시에 첨부한 주에 밝혀져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통은 이러한 사건을 마주했을 때 세상은 이를 가정폭력 문제로 보려 한다. 그 경우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 문제가 되고 만다. 폭력적 성향을 가진 개인적인 누군가가 일으킨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수미의 시 어디에도 이것이 가정폭력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는 구석은 없다.
시인은 이 폭력의 근원을 고민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신의 세 딸을 납치하여 죽인 이 끔찍한 폭력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세상이 그것을 한 개인의 폭력적 성향이라고 생각할 때 시인은 다른 곳에서 그 근원을 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소유이다. 이 끔찍한 사건 앞의 당사자로 선 “어머니의 오열” 속에 바로 그 소유라는 근원에 대한 실마리가 담겨있다. 어머니는 이렇게 외친다. “아이들은 당신 것이 아니야. 나는 당신 것이 아니야.”이 외침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외침이기도 하다.
사실 이 시는 무서운 가정폭력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시작은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어떤 안내판의 구절로 시작된다.
이곳은 사유지. 네가 잃어버린 건 뭐니? 사유는 사유하다의 사유이고 누군가 두더지처럼 땅에서 튀어나와 자신의 이름을 꽝꽝 말뚝 박고 간다. 당신이 밟고 있는 땅의 주인을 아십니까? 이 땅이 그들 것이라면 공기에도 이름이 새겨졌겠지
—진수미, 「무섭다」 부분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구절을 담고 있는 안내판은 누구나 한 번쯤 접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구절의 표지판 앞에 서면 우리는 이곳이 개인 소유의 땅인가 보다고 생각하고 지나친다. 하지만 시인은 사유지란 말 앞에서 “네가 잃어버린 건 뭐니?”라고 묻고 “사유는 사유하다의 사유”란 말을 덧붙인다.
사유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사유지의 사유는 개인의 소유란 뜻이다. 하지만 내가 같이 사는 그녀와 함께 밥을 먹다 이 시의 구절 중에서 “사유는 사유하다의 사유”라는 구절이 있다고 알려 주었더니 그녀는 생각하다는 사유를 말하는 거야 라고 되물었다. 때문에 시인이 말한 사유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생각하다는 뜻의 말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시인은 시의 말미에서 “사유는 사유하다의 사유이고 생각과 무관하지만 공포와는 가깝다”고 그 뜻을 정리하고 있다. 때문에 나는 땅을 개인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소유란 무엇일까. 혹시 그것이 생각의 상실을 댓가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갖게 되는 일은 아닐까.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 그런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무엇이든 소유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땅을 소유한다고 그 위의 공기마저 그들의 것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소유는 무서운 것이어서 그 소유 의식이 번지면 그 땅위의 “공기에도 이름이 새겨”져 땅을 소유한 자의 것이 되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는 아닐까. 그리하여 땅을 가져가지 않아도 그 땅을 밟고 숨쉬는 것마저 막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소유 의식이 내가 낳은 자식과 나와 결혼한 여자는 나의 것이라는 소유 의식을 키운 것은 아닐까. 그 소유 의식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식으로 번져나간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극의 근원적 출발점은 아니었을까.
시 속에는 혼란스런 대목도 있다. “사유는 사유하다의 사유이고 국유의 반대말이다”이란 부분이 그렇다. 내가 혼란스럽다고 한 것은 사유의 반대말은 국유가 아니라 공유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해를 하자고 들면 못할 것은 없다. 개인의 반대가 집단이고 그 집단의 궁극적 유형이 국가라고 생각하면 국유는 소유의 유형에서 사유의 반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경계를 갈라 그 둘을 반대의 극단에 세워두어도 실제로는 다를 것이 없다. 시인이 “그들의 것, 국가의 것, 그래서 달라지는 게 뭐지?”라고 묻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개인이 갖든, 국가가 갖든, 소유는 똑같다. 소유는 무서운 세상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언어가 현실을 지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의 언어”는 다르다. 어떤 땅을 등기하여 소유하면 “등기소에 기입된 성명은 국가의 이름으로 권위를 누”리며 언어는 “현실적 규정력을” 갖기에 이른다. 그리고 시인이 보기엔 그 규정력이 단순히 땅에 대한 소유를 넘어 자식에 대한 소유 의식으로 번져나간다. 그 세상에선 “국가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속삭이는 소리가 있”고 그 소리는“모두 나의 땅을 밟았잖아”라는 주장으로 땅에 대한 침범을 막는 배타적 소유 의식으로 나타났다가 “나의 성을 가졌잖아”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며 자식에 대한 소유 의식으로 번져나간다. 소유가 생각을 삼켜버리는 세상이다. 그리고 생각을 잃고 소유만 남은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 된다. 시인이 그런 무서운 세상을 말하며 이렇게 속삭인다. 땅의 소유가 당신의 생각을 가져가지 못하게 주의하라.
(2025년 1월 27일)
(인용한 시는 진수미 시집, 『고양이가 키보드를 밟고 지나간 뒤』, 문학동네, 2024에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