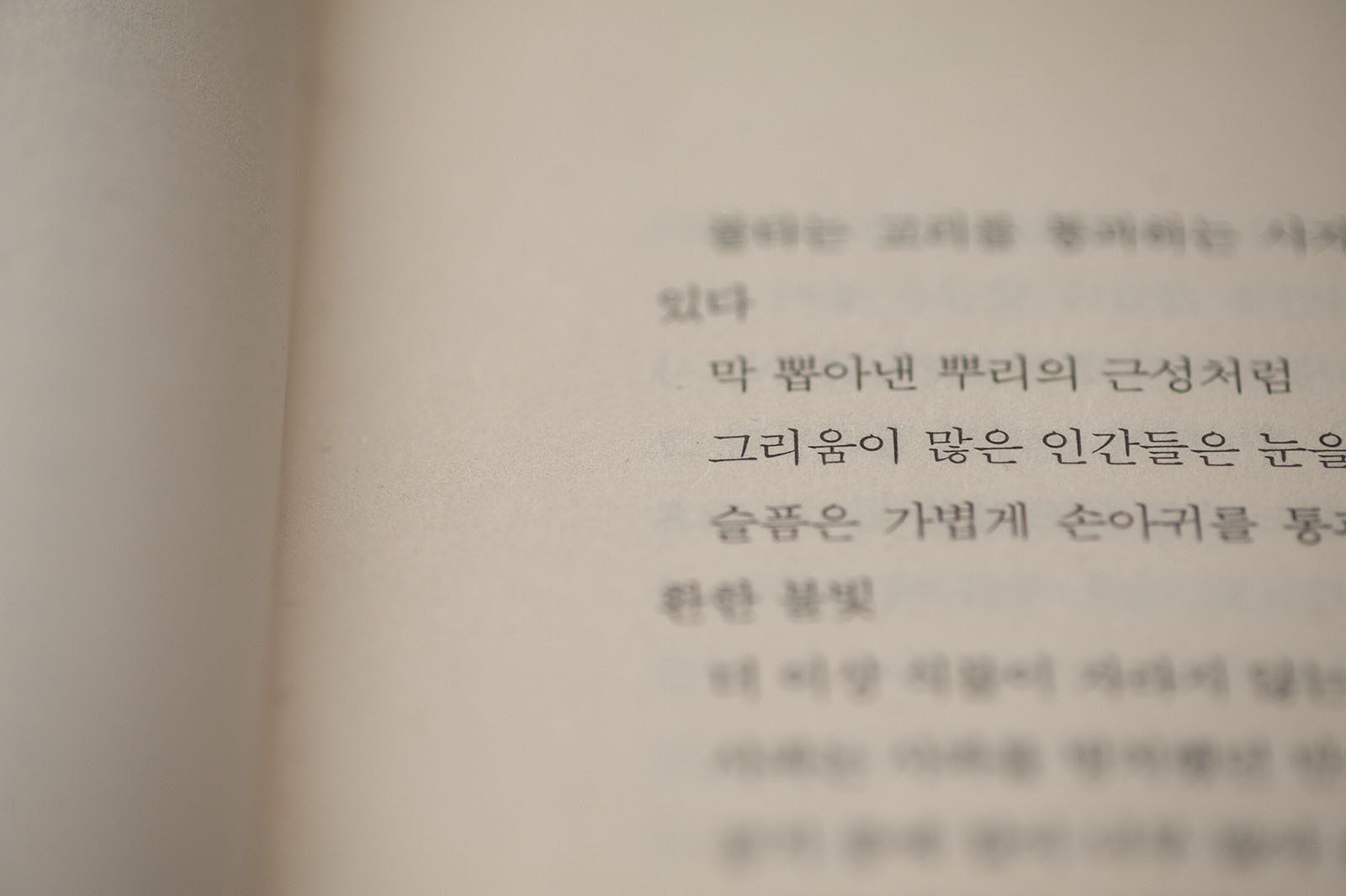시인 박성준은 그의 시 「벌거숭이 기계의 사랑」에서 이렇게 말한다.
불타는 고리를 통과하는 사자들의 몸은 늘 젖어 있다
막 뽑아낸 뿌리의 근성처럼
—「벌거숭이 기계의 사랑」 부분
시는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보다 의문을 불러올 때가 더 많다. 박성준의 이 시도 예외가 아니다. 이 시의 첫구절을 읽으며 서커스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불타는 고리”를 통과할 때 “사자들의 몸”이 “늘 젖어 있다”는 대목도 아마도 불에 붙지 않게 사자의 몸에 물을 뿌려주는가보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물에 젖은 사자가 왜 “막 뽑아낸 뿌리의 근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는 금방 이해가 가질 않는다. 나는 그 행간의 의문을 메워줄 답을 찾는 것이 시를 읽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하는 편이다.
그리하여 나는 먼저 서커스의 사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백수의 왕 사자가 아니라 혹시 뿌리뽑힌 사자가 아닐까 생각했다. 사자는 길들여져 서커스의 무대에 서고, 그리하여 사람들의 눈요기가 되는 순간, 뿌리뽑힌 삶을 산다. 그런 면에서 식물만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뿌리가 있다. 뿌리가 뽑히면 식물은 죽는다. 그런데 뿌리가 뽑혔다고 식물이 곧바로 죽는 것은 아니다. 막 뽑아낸 식물은 뿌리가 뽑혔는데도 여전히 살아 있다. 뿌리가 아직 수분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의 눈에는 뿌리가 뽑혔는데도 아직 살아있는 사자에게서 그렇게 수분을 움켜쥔 채 여전히 살아 있는 “뿌리의 근성”이 보였는지도 모른다. 사자는 동물로서는 살아 있을 수가 없다. 뿌리가 뽑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은 뿌리가 뽑히는 순간 식물로 전환한다. 그리고는 뿌리에 움켜쥔 수분으로 근성있게 목숨을 연명해 나간다. 동물이 뿌리가 뽑혀도 여전히 살아가게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뿌리의 근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앞구절과 연결되는 것 같지만 바로 뒤의 구절과도 연결이 된다. 식물은 뿌리가 뽑혀도 곧바로 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뿌리가 뽑힌 식물이 더 자랄 수는 없다. 나는 그 상황을 다음 구절에서 보았다.
그리움이 많은 인간들은 눈을 자주 깜빡거리고
슬픔은 가볍게 손아귀를 통과하는 비누 조각만큼 환한 불빛
더 이상 식물이 자라지 않는 기분입니다
—「벌거숭이 기계의 사랑」 부분
서커스의 눈요기 거리가 된 사자를 보면서 시인은 뿌리뽑힌 식물을 떠올린다. 하지만 동시에 시인은 뿌리뽑힌 사람들도 떠올린다. 둘다 아직 살아는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자라진 못한다. 어떻게 자라겠는가. 뿌리가 뽑혔는데. 그리고 뿌리가 뽑히면 “그리움이 많은 인간”이 되고, 또 “슬픔”도 많아진다. 시인은 그 “그리움이 많은 인간들”의 특징으로 “눈을 자주 깜빡거”린다는 것을 꼽는다.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일에도 눈하나 깜빡이지 않는 인간을 생각했다. 한번도 뿌리가 뽑혀보지 않은 인간일 가능성이 높다. 뿌리가 뽑혀보지 못한 인간은 모두 냉혈한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뿌리뽑힌 인간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가 없으면 그리되기 쉽다는 뜻이다.
그리움은 뿌리가 뽑히면서 올 때가 많다. 물론 그 그리움은 뿌리에 대한 그리움일 것이다. 그리고 그때면 슬픔에 잠기곤 할 것이다. 그 슬픔은 “가볍게 손아귀를 통과하는 비누 조각”처럼 우리를 빠져나가지만 동시에 “환한 불빛”이 된다. 나는 그것을 슬픔이 우리에게서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주면서도 동시에 슬플 때마다 내가 환해지는 느낌을 준다라고 읽었다. 그것이 뿌리 뽑힌 자들의 숙명적인 삶이지만 한편으로 다행한 일일지도 모른다. 슬픔의 조도가 항상 어두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숙명적 삶의 뒤에 드디어 식물의 예가 등장한다. 박성준이 들어준 식물의 예는 사과 나무이다. 그 사과나무의 열매인 사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과는 사과를 방치했던 만큼 사과에게로 간다
공기 중에 칼이 너무 많아 숨 쉬기가 힘들다
—「벌거숭이 기계의 사랑」 부분
나는 이 두 구절을 사과 나무는 내버려 두어도 나무에 열매가 열린다는 뜻으로, 그러나 그 사과의 운명은 결국은 우리들의 입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사과는 사과나무가 키운 열매이지만 어쩐 일인지 시인은 이 열매를 기계라고 부른다. 시 속에서 만나는 “그토록 푸르고 아름답던 기계들”이 사과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문구는 그 뒤의 “주목 없이도 아주 특별해지고 싶은 아이들”로 이어진다. 그 아이들은 ‘고아들’이다. 고아들은 뿌리뽑힌 사람들의 예이다. 아이들의 뿌리는 부모이고, 고아는 그 부모가 없으니 뿌리가 뽑힌 아이들이다. 시인은 그 고아들에게 ‘안녕’하고 인사를 하며 그 아이들이 “왜 수일이 지나서도/소설이 되지 않는가”를 묻는 것으로 시를 맺는다. 온전하게 다음과 같다.
그토록 푸르고 아름답던 기계들에게
주목 없이도 아주 특별해지고 싶은 아이들에게도
안녕, 그 많던 나의 고아들은 왜 수일이 지나서도
소설이 되지 않는가
—「벌거숭이 기계의 사랑」 이상 전문
사과라는 자연물을 “그토록 푸르고 아름답던 기계들”로 보는 시각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 대체로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자연과 기계는 대립 항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을 매우 정교한 기계로 보는 시각은 있다. 규칙성을 따지면 자연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돌보지 않아도 자연의 열매는 영글고, 계절도 다소 늦고 빠르고는 있어도 어김이 없이 오고 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아들은 보살펴줄 부모가 없이 방치된다는 측면에서 자연에 가깝게 성장한다. 그렇다면 모두 자연이란 말에 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기계인가.
아마도 맥락 때문일 것이다. 시인은 사자를 말할 때 서커스의 무대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사자의 삶을 동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때의 설명은 동물을 식물에 담아야 비로소 가능했다. 같은 맥락에 서면 자연도 자연에 담아선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자연이란 말에 담아내기에는 자연이 삶을 담아내는 방식이 너무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처럼 보여서, 자연이란 말에 그 삶을 담아내기는 무리로 보이질 않았을까. 그리하여 동물을 식물에 담아야 비로소 그 삶이 설명되듯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기계라는 말에 자연을 담아야 비로소 그 삶이 설명될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이 아니었을까. 너무 기쁘면 울듯이, 너무 자연스러워 그만 자연이란 말 대신 정반대의 기계라는 말을 덜컥 집어들어야 가까스로 그 삶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제 마지막 대목으로 넘어가보자. 내가 마지막 대목에서 떠올린 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 풀어놓으면 소설 몇 권은 나올 것이라는 그 흔한 얘기였다. 주로 나이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나 아직 아이들은 그럴만큼 나이가 들지 않았다. 우리는 나이든 사람들이 말하는 소설이 소설이 아니라 인생 푸념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이들이 아직 소설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인생 푸념은 아직 없다.
이 시는 다 읽고 나면 시를 거꾸로 읽어 올라가게 된다. 사회에선 에비 에미 없는 자식들이란 악의적 꼬리표를 붙이고 그들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이 빈번하게 있지만 시인의 시선은 그에서 멀리 비켜서 있다. 그 눈으로 바라보면 고아들은 ‘수일’이면 소설 한권이 나올 인생을 겪으며 자라지만 인생의 푸념으로 소설을 엮지 않는다. 대개의 아이들은 부모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지만 그들은 방치되어도 영그는 사과나무의 열매처럼 성장한다. 하지만 일찌감치 뿌리가 뽑힌 그들의 삶이 왜 어렵지 않았을까. 아마도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식물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뿌리가 뽑혀도 뿌리의 수분을 움켜쥐고 삶을 지키는 식물에 가깝다. 불의 고리를 통과하며 묘기를 부리는 사자도 그와 흡사하다.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와 달리 서커스의 사자는 사자로서의 뿌리가 뽑힌 사자이다. 그런 사자도 살아있다. 뿌리의 근성 덕택이다. 고아들도 그렇다. 그들은 험악한 삶의 무대에 일찌감치 내던져 졌으나 뿌리의 근성으로 살아남은 사자들이다. 그들은 가진 것 없는 벌거숭이이나 그들의 삶은 오직 사랑밖에 만들어낼 줄 모르는 벌거숭이 기계들이 엮어내는 사랑 노래이다.
시는 반드시 제목부터 시작하여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읽게 되어 있질 않다. 때로 시는 아래로 내려가며 읽은 뒤 다시 제목 쪽으로 올라가며 거꾸로 한번 더 읽어야 한다.
(2016년 2월 29일)
(인용한 시는 박성준 시집, 『잘 모르는 사이』, 문학과지성사, 2016에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