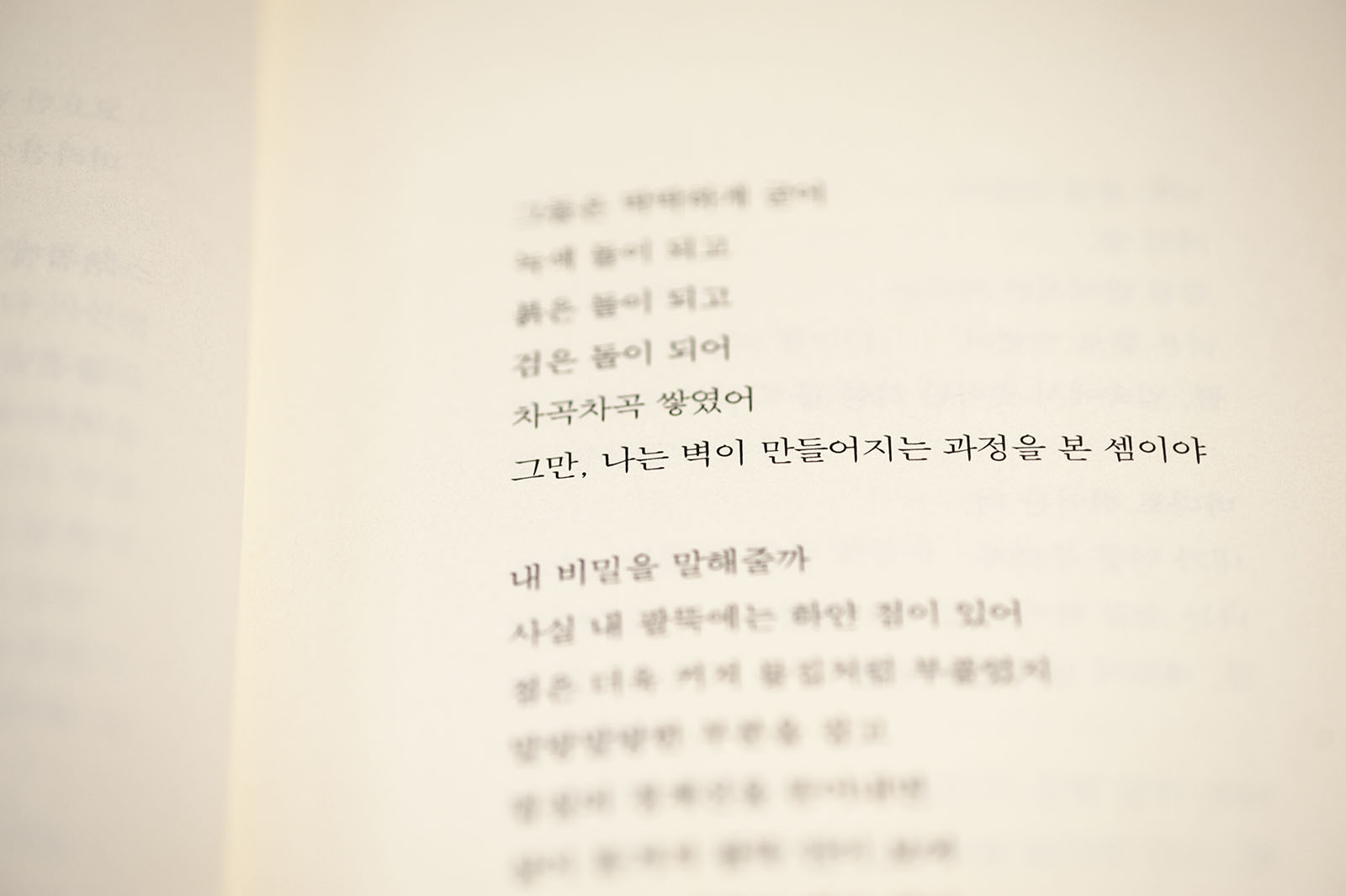시인 김소형은 그의 시 「벽」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만, 나는 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 셈이야
—「벽」 부분
그렇다면 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시인이 “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 셈”이라고 말했지만 벽은 이미 있었다. 시인은 그 벽을 가리켜 “그건 아주 낡은 벽이었”다고 말한다. 덧붙여진 설명도 있다. 그 벽에는 “하얀 점이 그려”져 있었고, 그 벽에 “너는 비밀을 적고/나는 하얗게 덧칠”을 하며 놀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벽에서 이상한 일이 생긴다. “점이 더욱 커”지기 시작하여 ‘거대’해지고, 결국은 “말랑말랑하게 부풀어 오른 하얀 점”이 된 것이다. 시인은 그 점을 가리켜 “마치 시간의 물집 같았”다고 말하고 있다. 같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물집이었다.
어느 날 ‘밤’에 결국 시인은 “힘껏 벽의 물집을 뜯”어내고 만다. 그러자 벽의 안쪽에서 “텅 빈 통로”가 나타난다. 그 통로의 “천장엔 거꾸로 매달린 실타래가 가득”하고 시인이 “톡 하고 건드리자/실타래가 쩍 벌어”지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쏟아”진다. 그리고 “그들은 딱딱하게 굳어/녹색 돌이 되고/붉은 돌이 되고/검은 돌이 되어/차곡차곡 쌓”인다. 그리고 시인은 그것을 보고 “나는 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 시인의 전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벽은 사람들이 딱딱하게 굳어 돌이 되고 그 돌이 쌓여서 생긴다.
그런데 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난 뒤 시인은 자신의 ‘비밀’ 하나를 털어놓는다. 사실 “내 팔뚝에는 하얀 점이 있”다는 것이다. 처음 말했던 “아주 낡은 벽”과 마찬가지로 그 “점은 더욱 커져 물집처럼 부풀”어 오르며 그 물집의 “말랑말랑한 부분을 잡고/껍질의 경계선을 뜯어내면/살이 뜯겨져 팔뚝 안이 보”인다. “그 속에는 핏줄도 뼈도 없”다. 때문에 시인은 “마네킹처럼 텅 빈 팔뚝”을 가졌다. 그리고 시인은 “쩍쩍 갈라진 그 속에는/아주 작은 팔이 자라고 있”고, 자신이 털어놓은 이 비밀을 가리켜 “나는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백한 셈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여기까지 읽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시는 읽질 않고, 시를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내 얘기 속에 여기저기 흩어놓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확언하건데 그건 오해다. 나는 시와 대화를 나눈 것 뿐이고, 시와 나눈 대화를 얘기의 방식으로 정리한 것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시를 읽지 않고 시와 대화 했다. 그것은 이러한 시가 전통적인 방식, 즉 시를 읽고 해석하려 드는 방식으로는 사람들을 너무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화의 방식을 취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가령 시가 “나는 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 셈이야”라고 말을 하면 내가 묻는 것이다. 아니, 잠깐만. 얘기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아주 낡은 벽”이 있었다고 말한 것 같은데. 그럼 시가 말한다. 어, 너 기억력 좋은데, 그걸 기억하다니. 그래 사실 처음에 그런 벽이 있었어. 내가 다시 일러주는데 그 벽에는 “하얀 점”도 하나 그려져 있었어. 시는 그렇게 말하며 나의 물음에 답한다. 시를 읽지 않고 이렇게 시와 대화하는 방식을 취하면 우리들은 시에 대해 아주 친화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시와 대화하고 그 대화의 끝에서 어떤 이야기의 방식으로 시를 정리한 것은 그 때문이다. 친해지면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기 마련이고 그러면 시로부터 시의 내밀한 얘기를 듣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도 이제 시와 대화를 나누며 내가 듣게 된 내밀한 얘기를 시작해 보려 한다. 우선 처음으로 돌아가 시인의 얘기를 다시 정리해보자.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건 아주 낡은 벽이었지
하얀 점이 그려진
그런 벽
너는 비밀을 적고
나는 하얗게 덧칠하는
그런 벽
점은 더욱 커졌지
거대해진 점
말랑말랑하게 부풀어 오른 하얀 점
마치 시간의 물집 같았지
—「벽」 부분
시인의 전언에 따르면 하얀 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집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벽은 벽이라기 보다 누군가의 피부였을 가능성이 크고, 하얀 점이 물집이 된 것을 보면 그 하얀 점은 마찰이 집중된 지점이었을 가능성이 커진다. 마찰이 작은 점에 집중될수록 물집은 더 잘생긴다. 사람들이 뒤섞여 살다보면 마찰이 없을 수 없다. 그 마찰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점점 커진다. 마찰이 커지다 보면 상대는 이제 벽처럼 느껴진다. 실제로는 벽이었는데 마찰이 커질 때까지는 그 사실을 잘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벽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된다. 다만 아직 물집이 생기지 않았던 것 뿐이다.
우리는 궁금해진다. 왜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이 물집이 되는 것일까. 그 물집을 뜯어보면 해답이 있을 것만 같다. 그래서 그 물집을 뜯어본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한다. “딱딱하게 굳어” ‘돌’이 된 사람들을. 사람들이 유연함을 잃으면 그렇게 돌이 되고, 그 돌들이 벽을 이룬다. 그렇다면 나는? 나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나의 비밀이다.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시인도 돌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일까. 물론 그럴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동시에 돌이되어 가는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주 작은 팔”을 갖고 있다. 나는 그것이 시인의 시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시인이 시를 갖지 못하면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고 일반 사람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비록 그 작은 팔을 갖진 못하지만 시를 읽는 것으로 그 작은 팔을 잡을 수는 있다.
시인은 시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도 시를 빼놓고 나면 우리와 크게 다를바 없는 막힌 인간이란 것을 고백한다. 그러나 시인은 시를 작은 팔처럼 내밀어 그 팔을 잡은 우리와 함께 그 벽을 넘어보고자 한다. 시와 대화를 나누며, 오늘 나는, 문득 그 팔을 잡은 느낌이었다.
(2015년 12월 9일)
(인용한 시는 김소형 시집, 『ㅅㅜㅍ』, 문학과지성, 2015에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