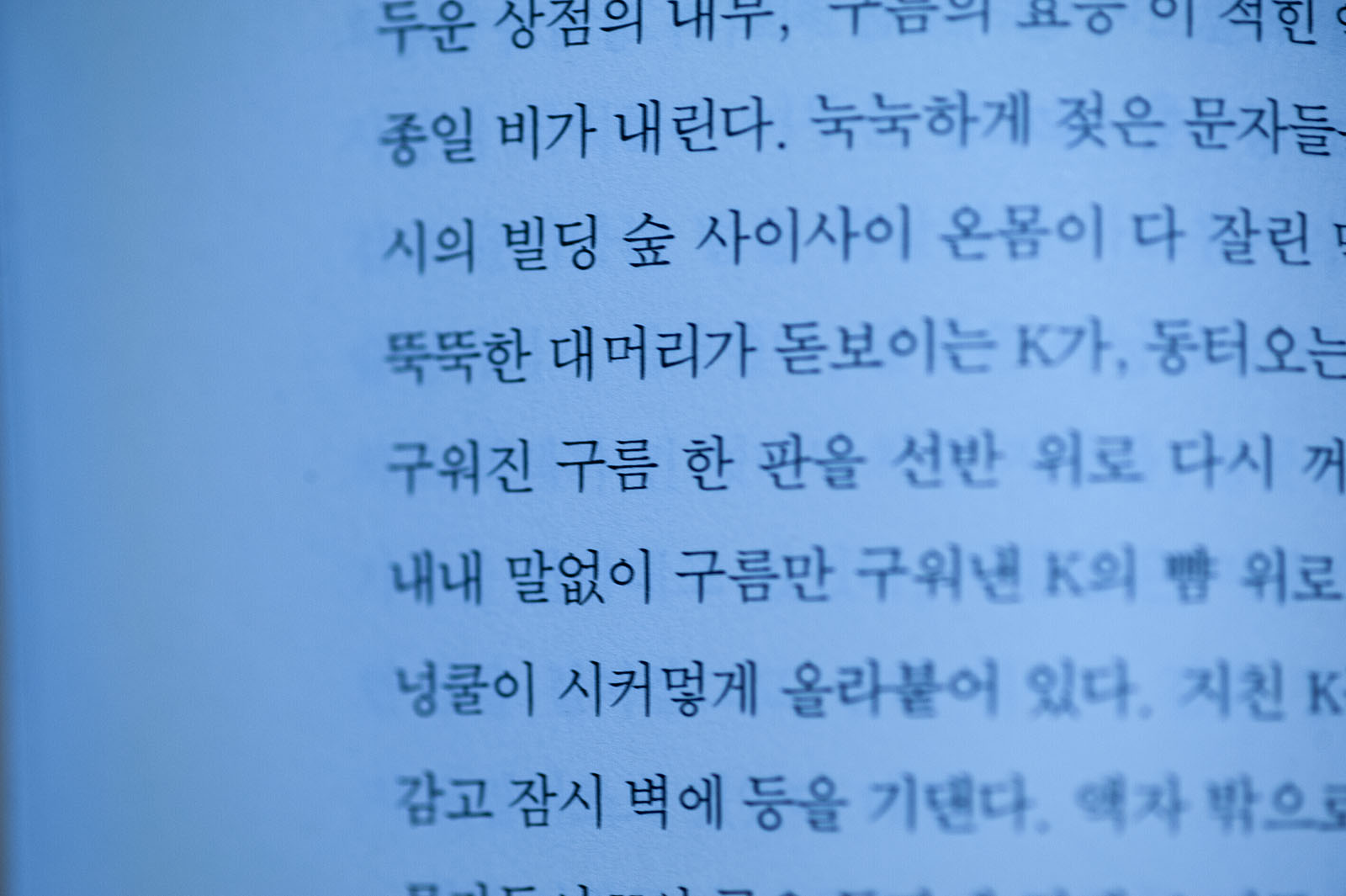시인 김중일은 그의 시 「구름이 구워지는 상점」을 이렇게 시작한다.
도시의 동쪽 끝에는 구름이 구워지는 상점이 있다
—「구름이 구워지는 상점」 부분
구름이 구름은 아니다. 구름을 구워서 팔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름이 무엇일까. “오븐에서 붉게 구워진 구름 한 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피자인가 했으나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들어, 선 채로 구름 한 점 더운 술에 적셔먹는 곳”이라는 말을 들으니 피자는 아니다. 선 채로 먹는 것을 보니 간단한 음식이다. 또 더운 술에 곁들여 먹는다고 했으니 피자보다는 안주에 가까운 듯 싶다.
“음식값을 말로 지불하는 곳”이란 구절로 보면 외상도 많은 집같다. 사람들이 “상점 앞에 묵묵히 줄을 서고 있다”는 구절로 보면 식당도 아닌 것 같다. 음식을 파는 곳은 분명한 듯한데 식당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고, 상점이란 말만 반복된다. 상점 앞에서 조그마한 터를 빌려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 구름을 구워 팔고 있는 사람은 K이다. 젊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온몸이 다 잘린 민둥산 같은, 무뚝뚝한 대머리가 돋보이는 K”라는 지칭 속에서 엿보이는 그의 용모 때문이다. 구름이란 말은 가볍지만 K의 삶은 힘겹고 고단해 보인다.
왜 시인은 K가 팔고 있는 것의 자리를 모두 ‘구름’이란 말로 대치한 것일까. 삶이 힘겹고 고단할수록 삶의 무게는 무거워진다. 무거운 삶은 삶을 짓누른다. 놀라운 점은 그렇게 힘겹고 고단한 무게 속에서도 삶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시인이 보기에는 K가, 또 K에게서 그의 음식을 사서 먹는 사람들이, 구름을 굽고, “구름 한 점”을 사서 먹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 즉 사람들은 그들의 무거운 삶으로 지상의 중력을 뿌리칠 가벼운 구름을 구워내고 그것을 사먹으며 삶의 무게를 삶으로 구워낸 구름으로 중화시킨다. 아마도 시인은 그 삶의 힘을 본 것이리라.
그 힘의 위력은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K의 아내 Y에게서도 엿보인다. Y가 “다시 상점으로 출근하는 K를 위해 구름 위를 걷는 낙타 한 마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어팔고, 또 남편이 팔 음식의 재료를 준비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구워내 그 구름으로 삶의 무게를 중화시키며 살고 있다. 낙타는 사막의 모래 속으로 몸이 내려앉을 만큼 삶이 무겁지만 또 한편으로 구름 위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울 수 있는 이유이다. 사실은 도시의 동쪽 끝만이 아니라 어디에나 구름을 구워 파는 상점들이 있다.
(2015년 6월 6일)
(인용한 시는 김중일 시집, 『국경꽃집』, 창작과비평, 2007에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