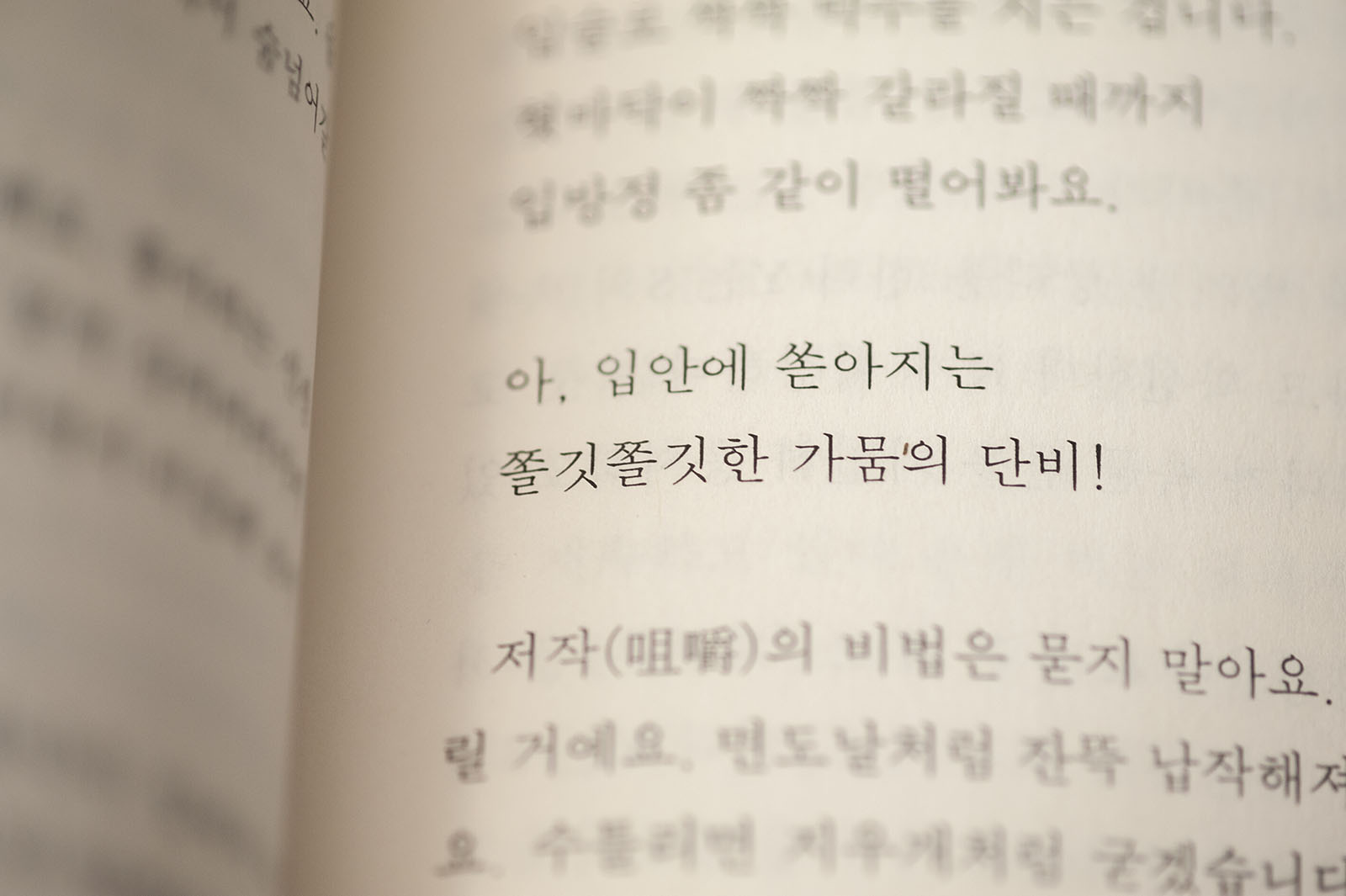사람마다 유난히 싫어하는 것이 있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첫손가락에 꼽아보면 내게 그건 껌씹는 소리이다. 질겅질겅은 다소 참을 수가 있다. 그건 소리라기보다 껌씹는 동작이다. 눈을 돌릴 공간적 여유만 있으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다. 대책없는 것은 짝짝거리며 껌을 씹어대는 소리이다. 내겐 그게 짝짝이 아니라 딱딱으로 들릴 때가 많다. 그건 주변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딱딱거리는 짓이다. 그때의 껌씹는 소리는 껌씹는 사람의 입을 바늘처럼 튀어나와 내귀를 찌른다. 거의 견디기가 어렵다.
나는 한때 뭉크의 그림 「절규」를 껌씹는 사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의 참을 수 없는 비명이 아닐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나는 껌씹은 소리에 대한 이러한 나의 태도가 혹시 나만의 문제는 아닐까하고 나를 돌아본 적은 한번도 없었다. 나는 나의 태도를 어떤 사회적 공분을 기초로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러한 사회적 공분의 논거로 삼은 것은 누군가 허튼소리를 했을 때 “껌씹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표현이었다. 그 소리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었다면 그런 부정적 표현이 나올리가 없다. 나는 그래서 굳건하게 그 껌씹는 소리를 싫어했다.
하지만 오늘 나의 태도는 일거에 무너지고 말았다. 나를 무너뜨린 것은 오은의 시 「추잉검」이었다. 그는 껌씹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소리에만 예민하게 반응했을 뿐 껌씹는 법을 모르고 있었다.
입천장에 짝짝 달라붙는 말들을 기억해요?
입맛을 짝짝 다시며
입을 짝짝 벌려보세요.
입아귀에 주름을 짝짝 그으며
입술로 짝짝 박수를 치는 겁니다.
혓바닥이 짝짝 갈라질 때까지
입방정 좀 같이 떨어봐요.
아, 입안에 쏟아지는
쫄깃쫄깃한 가뭄의 단비!
—오은, 「추잉검」, 부분
아니, 껌씹는게 이렇게 재미나고 즐거운 것이었어? 더 재미난 것은 시인의 관찰에 의하면 껌을 씹는 것이 “심심하거나/화가 나 있”을 때 그 “비밀이 드러날까봐 언제나 두”려운 우리들 내면의 억압된 어떤 심정으로부터 껌씹기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사람들은 “순간을 부풀리기 위해/배 터지기 직전의 개구리처럼” 껌을 씹는다.
나는 앞으로는 껌씹는 소리를 싫어하지 않을테다. 대신 시인이 일러주었던 싯구절을 떠올리며 껌씹는 순간의 그 즐겁고 역동적인 소리를 즐기고, 그 소리의 뒤끝에서 결국 배가 부풀어 올라 뻥 터지고 마는 개구리를 상상하며, 낄낄거리는 웃음으로 그 껌씹는 소리의 순간을 지나갈테다. 그러니 배터질 개구리들이여, 열심히 씹으시라. 나는 이제 그 순간을 즐길테니.
(2013년 7월 15일)
(인용한 시구절은 오은 시집,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문학동네, 2013에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