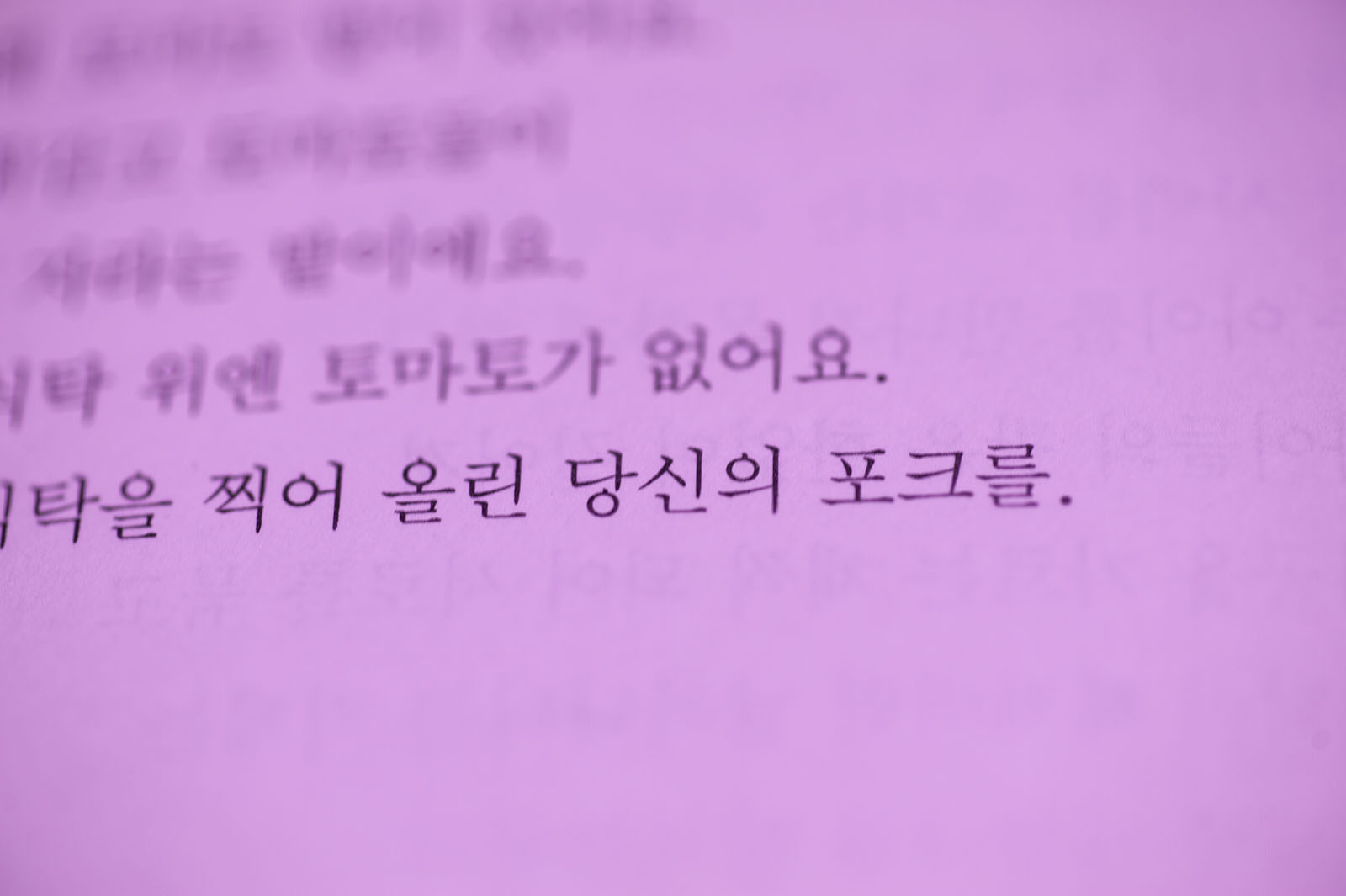
시인 이수명은 그의 시 「식탁」을 “식탁 아래 토마토 밭이 있어요”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우리 집에도 식탁이 있다. 부엌에 있다. 나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부엌으로 나가 식탁의 아래쪽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당연히 토마토 밭 같은 것은 없다. 식탁의 아래쪽은 마루 바닥이다. 다른 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 이 구절은 대다수의 집에서 실질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구절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를 어떤 상징으로 받아들이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이 구절에서 어떤 상징을 짚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사실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상징으로 받아들여도 그 상징의 속을 들여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구절은 대개의 경우 사람들을 난감하게 만든다. 난 난감한 상황을 그렇게 좋아하질 않는다.
그리하여 난 이 상황을 쉽게 풀어가려고 내 나름대로 모종의 음모를 꾸민다. 그 음모의 끝에서 나는 이 구절의 앞에 원래 한 구절이 더 있었는데 시에선 그것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 구절은 식탁을 토마토 밭에 차렸다이다. 그러면 “식탁 아래 토마토 밭이 있어요”라는 구절은 아주 자연스러워 진다.
의문은 생긴다. 그 구절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해되었을 구절을 왜 그 구절을 생략하여 상황을 난감하게 만든 것일까. 우리는 식탁 아래 마루 바닥이 있다는 말을 할 때 식탁이 굳이 집안의 부엌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우리에게 식탁은 암암리에 부엌의 가구이다.
우리의 버릇처럼 시인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말버릇을 탓하지 않는다면 시인의 말버릇도 탓할 수는 없다. 시인에겐 토마토 밭의 식탁이 우리 부엌의 식탁처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런 공간일 수 있다. 이제 이를 받아들이면 토마토 밭에 차린 시인의 식탁에서 시의 모든 구절이 이해될 수 있다. 이제 전문을 보자.
식탁 아래 토마토 밭이 있어요.
식탁을 휘감고 토마토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밭이에요.
보세요, 식탁 위엔 토마토가 없어요.
보세요, 식탁을 찍어 올린 당신의 포크를.
—이수명, 「식탁」 전문
마지막 구절을 제외하면 이제 어려운 구절은 없다. 토마토 밭에 식탁을 놓아두면 그렇게 된다. 식탁의 주변으로 마치 식탁을 휘감고 자라는 듯 토마토들이 자라고 있을 수 있다. 토마토 밭에 식탁을 두었지만 굳이 토마토를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식탁이란 그런 것이다. 식탁이란 토마토 밭에 놓여 있다고 토마토를 먹어야 하는 탁자는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은 우리들을 다시 약간 주춤거리게 만든다. 우리들은 음식을 찍어먹지 식탁을 찍어 올리진 않는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가 식탁을 찍어올렸다고 말한다. 언어 습관이란 그런 것이다. 우리는 상을 차리고 한상 잘 차려 먹곤 한다. 상을 먹진 않는데도 우리의 언어 습관은 그렇다.
그 언어 습관은 식탁으로도 그대로 옮겨간다. 그래서 시인의 눈에 우리는 포크로 식탁을 찍어올린다. 한상 잘 차려 먹을 때처럼. 시인은 식탁을 차리면서, 그 식탁 위에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뒤흔든다. 시인이 우리의 언어 습관을 흔들 때, 시인이 흔드는 대로 흔들려주면 우리는 시인의 시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흔들리면서 얻는 시의 세상이며, 대체로 그 세상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 습관의 세상보다 즐겁다. 이수명의 「식탁」에서도 그 점은 예외가 아니다.
(2015년 11월 23일)
(인용한 시는 이수명 시집, 『왜가리는 왜가리 놀이를 한다』, 세계사, 1998에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