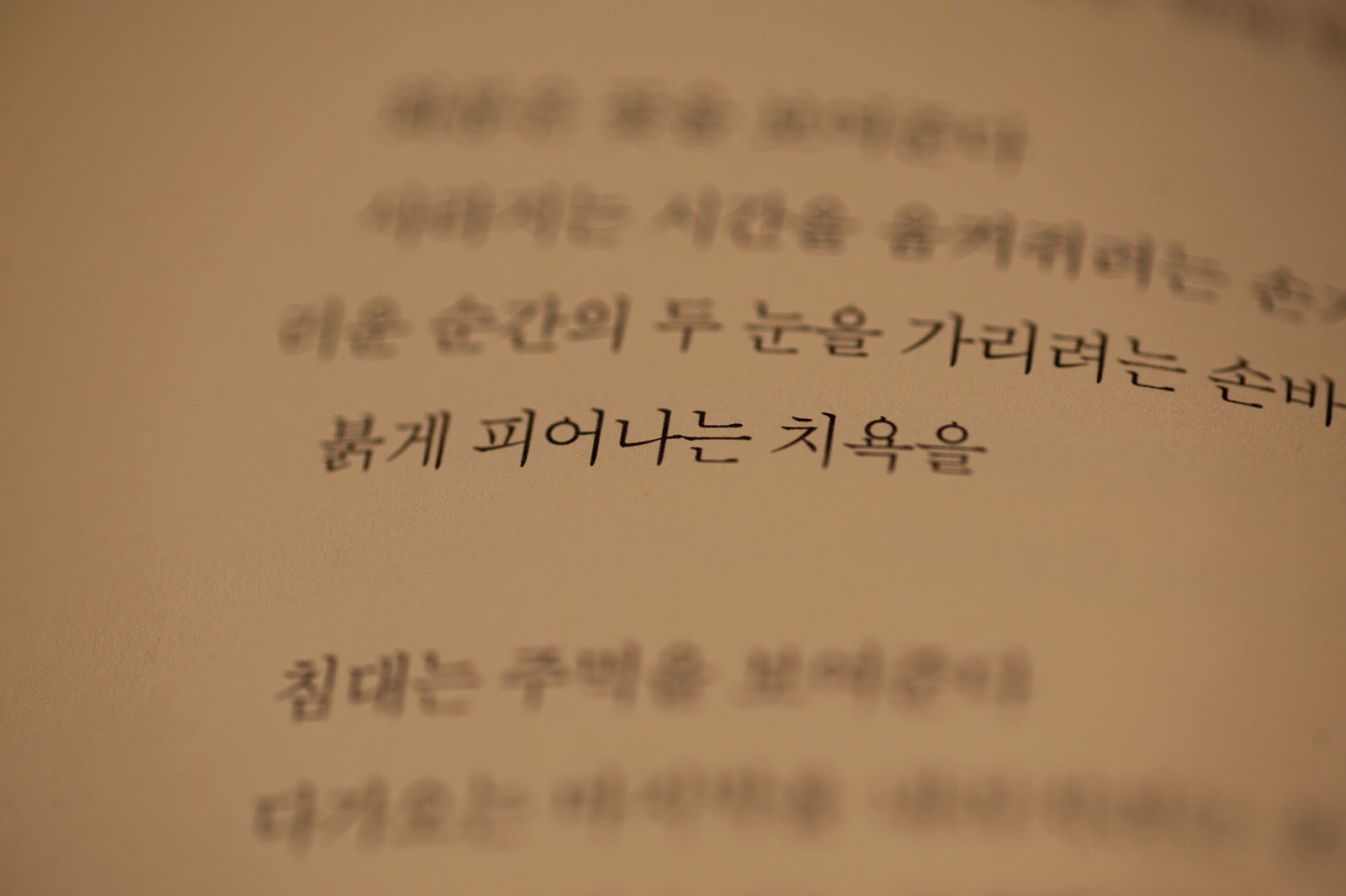내가 시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가 갖고 있는 전복의 힘 때문이다. 나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한편으로 그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지루함을 못견뎌 한다. 그런데 시는 일상의 지루함을 뒤엎는 전복의 힘을 갖고 있다.
내가 사는 집에도 잠자는 방에는 침대가 있고 베란다에는 화분이 있다. 나는 가끔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며 항상 계절보다 일찍 찾아오는 화분의 꽃들 앞에서 눈이 즐거운 한 순간을 갖기도 한다. 내게 침대와 화분은 휴식과 눈의 안식을 안겨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는 시인 유병록의 시 「침대와 화분」에서도 그 침대와 화분을 만난다. 하지만 시 속의 침대와 화분은 우리 집에서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인은 이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다.
여기 살아 있는 건 둘뿐이다
무수한 고통이 찾아와 쓰러지는 침대와 한밤중에도 눕지 않는 화분
시인의 얘기에 따르면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마다 침대에 쓰러져 잠들며, 잠든 동안 고통을 잠시 잊기도 하지만 그렇게 고통을 받아주는 침대는 “일어서”질 못하고 매일 누워있다. 반면 화분은 한밤중에도 눕는 법이 없다.
시인은 “일어서지 못하는 침대가 화분에 침을 뱉는다”고 말한다. 도대체 왜 침대가 화분에 침을 뱉는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무수한 고통이 찾아와 쓰러지는 곳이 침대이니 그 고통에 화가 치밀면 침을 뱉을 만도 할 것이고, 하필 화분이 그 옆에 있다가 매번 봉변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어쨌거나 침대가 침을 뱉았으니 화분은 치욕스러울 것이다. 시인은 그리하여 “화분은 치욕에 담긴 몇모금의 연명을 향해 뿌리를 뻗는다”고 말한다. 침은 수분이기도 하다. 치욕스러우면서도 살기 위해 화분은 그 침 속의 수분을 받아 연명을 하려 뿌리를 뻗는다.
시인은 화분이 그렇게 살면서 “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화분이 치욕의 삶을 감당하면서도 살아가는 것은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치욕적 삶을 감당하면서 피는 것이기에 시인의 눈에 화분에서 피는 꽃은 “붉게 피어나는 치욕”이다. 언제나 아름답던 화분의 꽃이 시인의 세상에선 붉은 치욕이다. 때문에 시인에겐 화분의 꽃이 “사라지는 시간을 움켜쥐려는 손가락”이나 “고통스러운 순간의 두 눈을 가리려는 손바닥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꽃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핀다.
그럼 침대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침대는 주먹을 보여준다
—「침대와 화분」 이상 모두 부분
그래서 침대에는 ‘적의’가 있다. 아마도 고통스러워 침대에 쓰러진 자들이 주먹으로 침대를 두들기며 분노에 찬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다.
시인은 이러한 침대와 화분의 공존 앞에서 “이 기묘한 동거를 연애라 불러도 좋을까”라고 묻는다. 침대는 ‘완력’을 갖고 있지만 “시간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고 화분은 언제나 ‘직립’의 자세로 서 있으면서도 “살아서는 여기서 한발짝도 걸어나갈 수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둘은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하지만 사실은 적의와 치욕의 다른 이름이며, 시인의 눈에 “적의와 치욕은 닮았다.”
유병록의 시 「침대와 화분」은 우리들이 침대하면 휴식과 안식을 떠올리지만 항상 침대가 휴식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 자리가 고통과 번민의 자리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시인의 얘기는 맞다. 침대 속에서 밤새도록 불면의 밤이 뒤척거릴 때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침대하면 마치 자동 반응을 하듯 휴식을 떠올린다. 침대는 때로 휴식의 자리가 아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며, 그 자리에서 번민할 때도 많다. 침대가 적의의 자리가 되면 화분은 치욕의 자리가 된다. 침대는 침대고 화분은 화분인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시인은 침대와 화분의 세상이 때로 적의와 치욕으로 ‘데깔꼬마니’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일상적인 침대와 화분의 세상이 뒤집히는 순간이다.
궁금하긴 하다. 어쩌다 침대와 화분의 사이는 적의와 치욕의 사이가 된 것일까. 혹시 고통과 번민으로 밤을 새기 일쑤인데 항상 환한 낯빛의 꽃으로만 살아가는 화분이 그 적의를 부른 것은 아니었을까. 눕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한 생인데 꽃길만 걷는다고 적의를 보이는 시선이 치욕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
그 연유가 어찌됐든 나는 시만 즐길 생각이다. 신경질 난다고 침대에 주먹질해대고 화분에 침뱉는 짓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적의가 불러다 줄 치욕의 데칼코마니는 시속에서 즐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2014년 3월 10일)
(인용한 시는 유병록 시집 『목숨이 두근거릴 때마다』, 창비, 2014에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