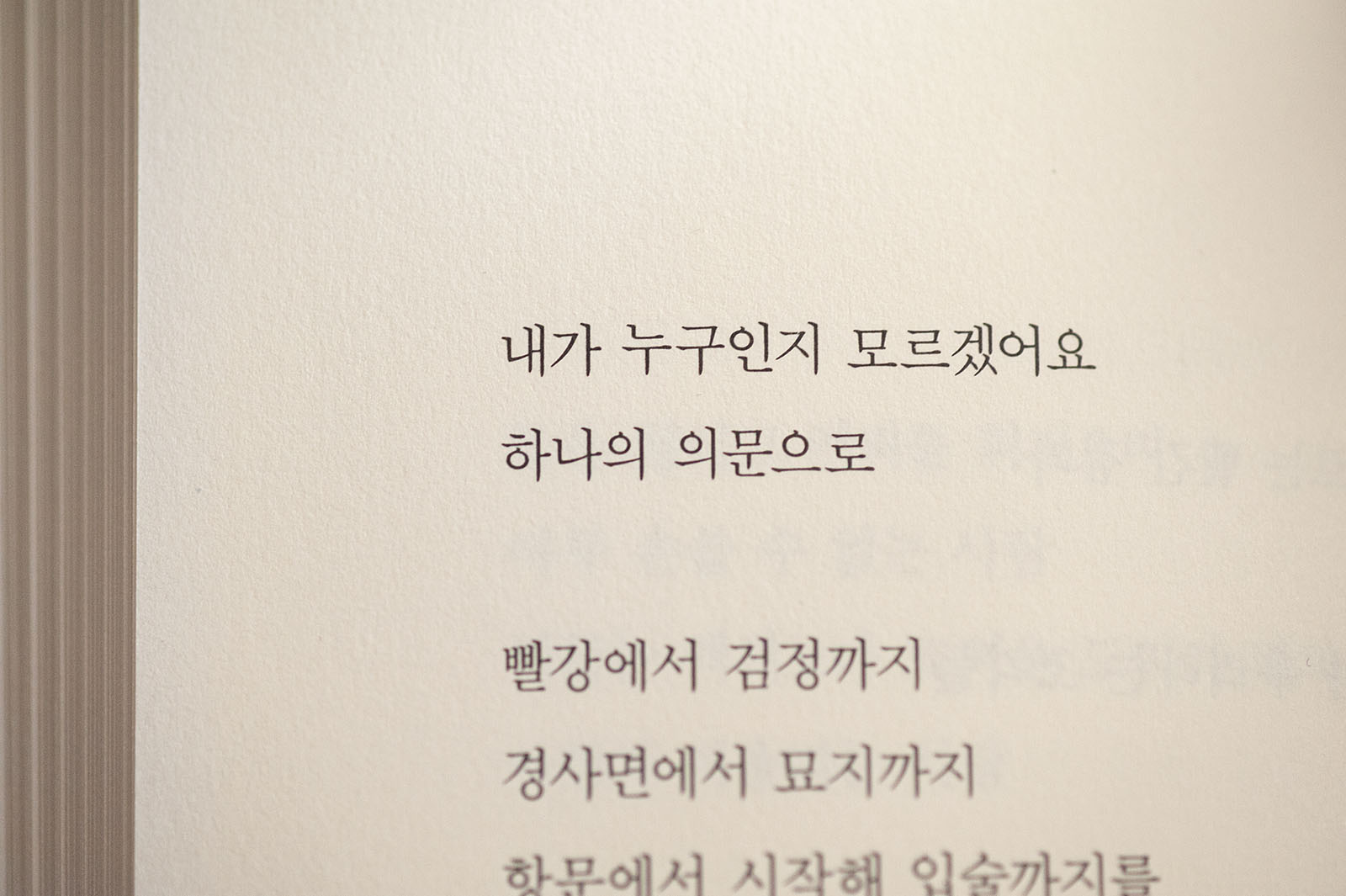시인 유계영의 시 「온갖 것들의 낮」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의문으로
빨강에서 검정까지
경사면에서 묘지까지
항문에서 시작해 입술까지를
공원이라 불렀다
—유계영, 「온갖 것들의 낮」 부분
때로 시를 읽기 위하여 시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다. 시의 언어가 뒤엉켜 있어 매듭을 풀기 힘든 상황으로 보일 때는 더더욱 그렇다. 유계영의 이 시에서도 그렇다. “항문에서 시작해 입술까지를” 왜 시인이 ‘공원’이라고 불렀는지를 묻는 순간, 우리는 시의 언어 속에 휘말려 버린다. 시에 휘말리면 더 이상 시를 읽어가기가 어렵다.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는 과감하게 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리하여 시의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공원이라는 말만 취한다. 그 말을 취하는 순간, 내겐 공원에 앉아 있는 시인이 보인다. 시인은 생각에 잠겨있다. 그 생각 속에서 시인은 스스로 고백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아마도 그 고백은 내가 누구일까를 묻는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공원에 앉아서 그런 생각에 잠기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하나의 의문”은 하나의 의문으로 끝나질 않는다. 그 의문은 색에 대한 의문으로, 또 그의 눈에 들어오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어떤 지형과 공원 내에 있는 누군가의 무덤에 대한 의문으로(어떻게 하다 공원에 묘지가 자리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자신의 신체 부위에 대한 의문으로 퍼져 나간다.
나는 공원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공원이 아니라 나의 생각 속에 앉아 있다. 시인은 공원에 앉아 있었던 것일까. 시인은 분명히 공원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시인은 자신의 생각 속에 앉아 있었다. 시인은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온갖 것에 대한 의문과 그로부터 비롯된 생각을 공원과 하나로 묶고 만다. 바로 그때 이런 구절이 탄생한다.
다행이 다음 구절은 어려움이 없다. “바람이 불자 화분이 넘어졌”고 “화분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고/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원에서 본 한 순간의 장면일 것이다. 엉킨 언어를 풀어낸 우리가 잠시 숨을 돌리는 순간이기도 하다.
다음 구절은 다시 혼란스럽다. “나는 어제 탔던 남자를 오늘도 탔다/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원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 시인을 상상하고 시 속에서 그 시인의 생각과 공원이 뒤엉켜 있다고 보았던 시읽기의 방법은 이번에도 유효하다. 이번에는 시인이 공원의 그네를 타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그네를 타면서 시인은 자신이 만났던 남자 생각을 하고 있다. 어제도 그네를 타면서 그 남자 생각을 했었다. 시 속에선 남자 생각과 그네가 뒤섞이면서 그네의 자리에 남자가 들어가 버린다. 남자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대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이쯤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일까라는 의문을 촉발한 것이 시인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 남자였다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된다.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겐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내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다. 그 질문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어제도 오늘도 공원의 그네에 앉아 그 생각이다. 그런데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말하려는 것이 오히려 더 잘 전달되지 않나. 왜 남자를 탔다고 말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일까.
시가 그렇게 말을 하면 시인은 혼란스러운데 그 혼란이 잘 정리되어 우리들은 하나도 혼란스럽질 않게 된다. 시인은 그렇게 잘 정리된 혼란으로 우리들이 시인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가 아니라 혼란 자체를 전하는 것이 시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시는 그네의 자리에 남자를 대체한다. 우리들은 시인의 혼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혼란을 고스란히 겪게 된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시이다.
나는 이런 혼란이 더욱 심해진 부분이 다음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시인은 “어제 먹어 치운 빵을 태양이 등에 업고/나는 태양을 등에 업고/너는 나를 등에 업고/비둘기가 아주 잠깐 날아올랐지만”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를 어제 내가 빵을 주었던 공원의 비둘기들이 해를 등지고 날아오르는 장면으로 보았다. 하지만 생각이 뒤엉키면서 태양을 등지고 앉은 내가 비둘기와 뒤섞인다. 생각이 혼란스러운 순간의 시인을 고스란히 겪는 느낌이었다.
시의 나머지 부분은 어려움이 없다. “공원의 한낮이 우르르 시작되었다”는 대목을 나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공원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으로 보았다. 사람들이 제거된 것은 시인이 자신의 생각에 집중한 결과일 것이다. 너무 집중하면 그 자리에 있어도 인식이 되지 않는다. 공원의 사람들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시는 읽는 것이 아니라 겪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시를 읽고 있었지만 읽었다기 보다 공원에서 보낸 시인의 한낮을 겪었다.
때로 시 속의 언어가 혼란스럽기만 한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시를 벗어나야 시가 읽히고 보일 때가 종종 있다. 때로 언어에서 길을 찾지 말고 상상으로 언어의 길을 밝혀야할 때가 있다. 그러면 읽는 것을 넘어 시를 겪을 수 있다. 사실은 그게 훨씬 재미난 시의 세상이다.
(인용한 시는 유계영 시집 『온갖 것들의 낮』, 민음사, 2015에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