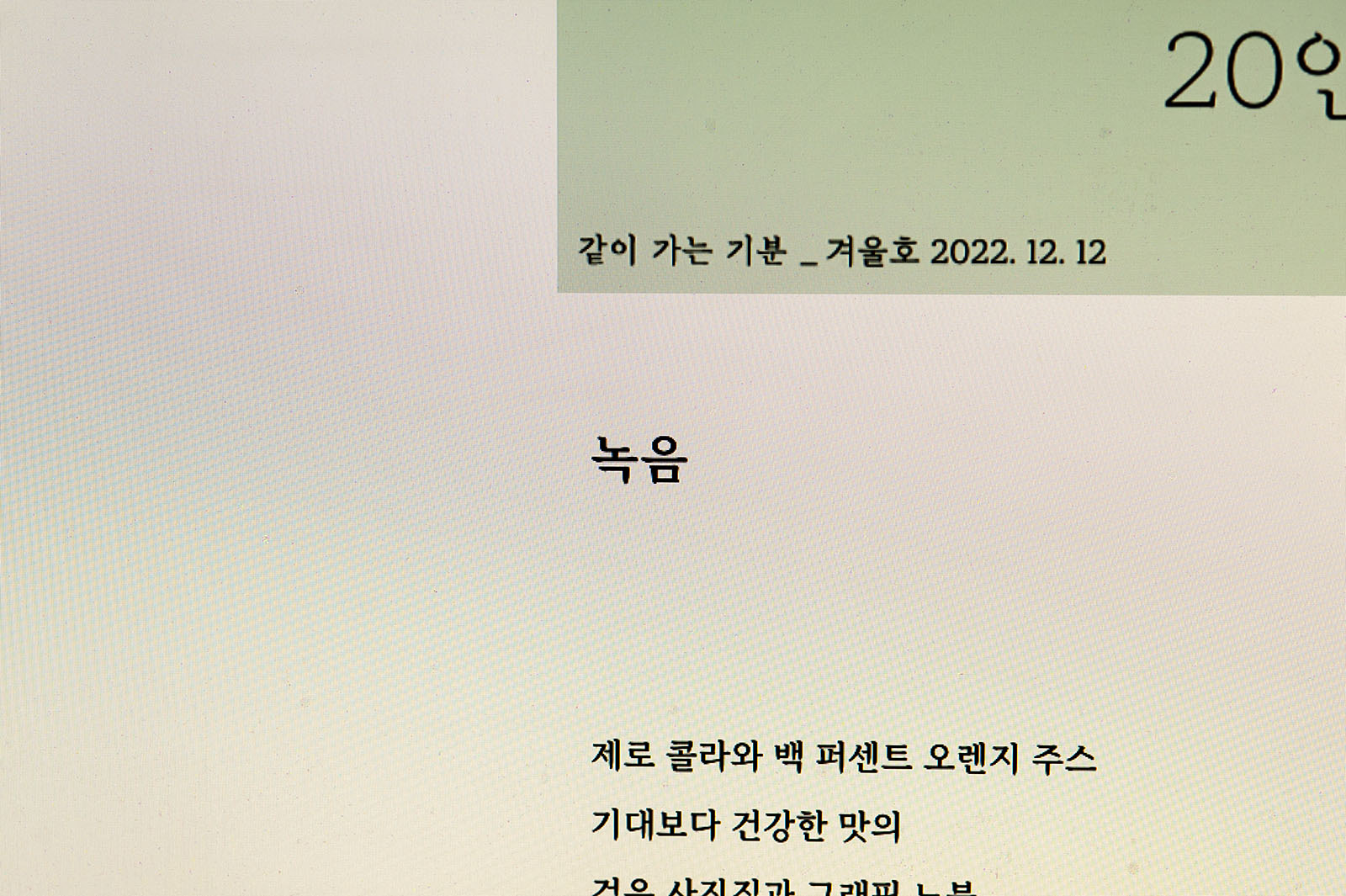
시인 강혜빈은 그의 시 「녹음」에서 이렇게 말한다.
땀 흘리는 두 사람이
마스크를 반만 벗고
입 맞추는 장면을,
나무는 기록한다
떨며, 떨며 자신의 잎 위에
—강혜빈, 「녹음」 부분
나는 이를 시와 일상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로 보았다. 그렇다면 일상의 세상은 어떨까. 일상에선 같은 장소에 서 있었다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나무 밑에서 연인이 입을 맞추고 있었을 것이다. 그랬던 일상이 시의 세상으로 바뀌면 잎이 흔들리는 현상이 그 밑에서 입을 맞추고 있는 두 연인의 사랑을 기록하는 일이 된다. 잎이 떨리는 것은 그 장면이 가슴 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잎은 가슴 떨리는 장면에선 잎을 떨어 그 장면을 일종의 상형문자나 행위로 기록한다. 사랑을 기록하던 이 나무는 시의 다른 곳에도 흩어져 있다.
가령 “손등에는 푸른 나뭇가지”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은 둘의 사랑을 기록하던 나무라는 이미지 때문에 내게는 손등에 받은 인증 스탬프 쯤으로 이해가 되었다. 우리는 가끔 어떤 행사에 참가하거나 둘레길을 걸을 때면 손등이나 팔뚝에 인증 스탬프를 받을 때가 있다. 나무는 그 밑에서 사랑을 나눈 연인들에게 인증 스탬프를 찍어준다. 아니, 아예 손등에 푸른 나뭇가지를 심어준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다. 당사자들에게만 보이는 기억의 나뭇가지이다. 시의 세상에서만 받을 수 있는 실물형 스탬프이기도 하다.
“여름에 만나서 사랑한 우리는/적극적으로 견딘다 여름의 우리를,/깍지 낀 손 안에서 찰랑이는 호수”라는 구절에서 “깍지 낀 손 안에서 찰랑이는 호수”는 내게선 찰랑이던 호숫가를 서로 손을 깍지 끼고 데이트를 했던 기억이다. 우리는 가끔 기억으로 사랑을 견딘다. 시의 세상에선 그때가 되면 그때 우리의 곁에서 “찰랑이던 호수”가 우리의 손에서 찰랑거리고 있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 속의 남녀는 서점 안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이 여름에는 뜨겁게 사랑을 했으나 지금은 그 사랑이 많이 식었구나 하는 짐작도 가능하다. 시는 “서점은 나무들의 날숨으로 가득해/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가득해”라는 구절로 시를 마무리한다. 나는 책의 종이가 나무로 만드는 것이라서 책을 “나무들의 날숨”으로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서점에 책이 많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재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금방 그 생각을 거두어 들였다. 그보다는 서점에 오늘따라 연인들이 많았다로 이해를 했고, 그들에게 모두 나무들이 기록해둔 사랑의 기억이 있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자 “나무들의 날숨”은 나무가 기록해둔 사랑의 기억이 되었다. 일상의 세상에선 서점에 유난히 쌍을 이룬 남녀가 많은 날이었지만 시의 세상에선 그들의 사랑을 기록해둔 나무들의 기억이 가득한 날이다. 뜨겁게 사랑했던 한때의 기억만으로 보면 서점 안은 시의 제목대로 「녹음」으로 우거져 있다. 말하자면 시의 세상은 책만 있는 일상의 세상을 나무가 푸르게 우거진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세상을 새롭게 열어주는 시가 시 속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세상으로 걸어나와 시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세상을 새롭게 열어준다는 것이다. 가령 나는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서울 명동의 세종호텔 앞에 있었다. 강혜빈의 시 「녹음」을 읽고 난 다음 날이었다. 그곳에선 매주 목요일 세종호텔의 해고노동자들이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며 자신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날은 오전에 눈이 내렸다. 세종호텔의 건물 바깥에는 노동자들이 세워놓은 판넬들이 벽에 기대어 서 있다. 판넬에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 날은 보통 때와 달리 내린 눈이 판넬을 따라 흘러내려가다 판넬의 밑에 쌓여 있었다. 아래쪽은 눈에 가려 글귀가 보이질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 시각이다. 그러나 시인이 알려준 세상, 그러니까 나무가 잎을 떨어 그 아래서 입을 맞추는 연인들의 사랑을 기록하는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을 바꾸면 판넬의 눈도 전혀 다른 기록이 된다. 그 기록은 판넬의 글자에 담긴 주장을 읽어내려 가던 눈이 판넬의 목소리를 지나치지 못하고 글자들의 끝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 글귀와 함께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전한다. 말하자면 판넬의 주장은 눈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된다. 그러면 그 순간 눈은 글자들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멈추고 그날의 해고노동자들 집회에 함께 하는 마음이 된다. 명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해고노동자들이 집회를 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 현장을 지나간다. 만약 그곳을 지나던 사람 중에 누군가 그 집회의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그 목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시위의 일원으로 함께 했다면 그는 눈과 같은 사람이 된다. 시는 단순히 시의 세상에 고립되어 있지 않다. 때로 세상으로 나와 노동자들의 집회 현장에서 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을 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든다.
시의 세상은 일상의 세상과 뒤섞여 있다. 시의 세상이 우리의 일상에서 멀지 않다는 얘기도 된다. 하지만 둘은 완연하게 다르다. 둘의 세상을 모두 알고 나면 시의 세상이 훨씬 괜찮다.
(2022년 12월 14일)
(2022년 12월 23일 보강)
(인용한 강혜빈의 시는 웹진 ⟪같이 가는 기분⟫ 2022년 12월 겨울호에 실려있다. 시의 전문은 다음 주소에서 읽어볼 수 있다. https://blog.naver.com/webzineseein/222920528244 )

2022년 12월 15일 서울 명동의 세종호텔 앞에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벽에 기대어 세워놓은 판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