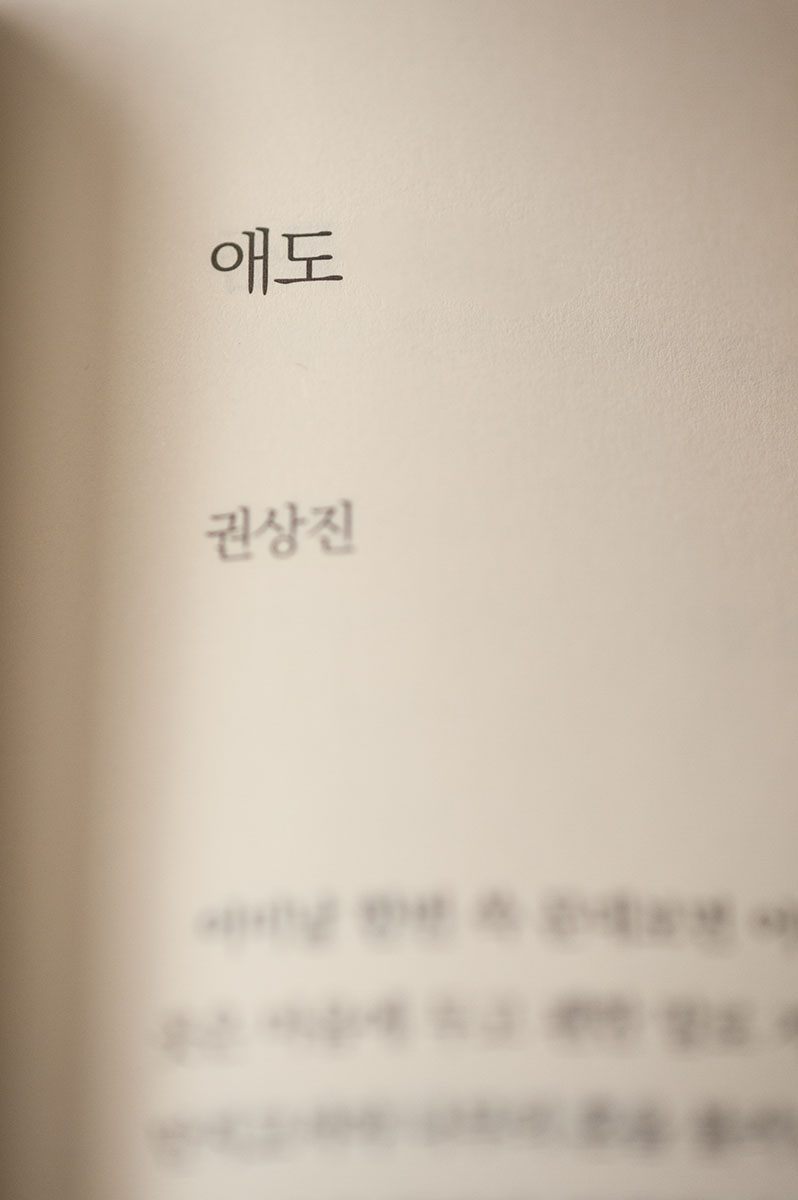
시인 권상진의 시 「애도」는 대패질과 목재로 다시 태어나는 나무 이야기로 시작된다. 대패로 나무를 깎아 목재를 만드는 일은 권상진에게 있어 나무의 혼을 불러내는 일이다. 때문에 대패질로 우리는 죽은 나무의 영혼에 닿을 수 있다. 시인은 대패질을 말하며 “껍질을 열고 한 겹 한 겹 나뭇결을 꺼내 읽다가 전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서 날을 멈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가장 아름다운 결이 “보통 꿈결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준다. 나무의 영혼에 닿는 순간이다. 나무는 죽었으나 그 영혼에 닿는 순간, 다시 몸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몸이 된 나무의 영혼과 함께 할 수 있다. 목재가 우리의 가구가 되었을 때 그 가구는 다시 몸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된 나무의 영혼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나무가 죽었다고 해도 그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니다. 나무는 영혼을 몸으로 내주며 다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는 대패질과 목재에 관한 시가 아니다. 이 시는 나무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시이다. 나의 말은 혼란을 부른다. 나무는 죽어서 그 영혼을 몸으로 내주며 우리에게 와서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 같은 것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하게 되므로 나무의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수에게 나무의 죽음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되는 날이 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몇 날 며칠 숲으로” 가게 되는 날이기도 하다. 시인은 그 날이 어떤 날인가를 이렇게 알려준다.
끔찍하기도 하지 덜 마른 나무를 깎는 밤은
느닷없는 죽음은 싱싱하지만 쓸 곳이 마땅찮다 물기가 있는 나이테의 소용돌이에 대패는 이물부터 침몰하거나 빽빽한 대팻밥에 날이 걸린다
—권상진, 「애도」(『문예바다』, 2022, 겨울호)
“느닷없는 죽음”으로 아직 물기도 “덜 마른” 어린 ‘나무’를 마주했을 때, 목수의 대패는 매끄럽게 죽은 나무를 깎아내지 못한다. 시인은 “속내를 결에 새긴” 것이 나무의 나이테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여 나이테란 자신만 알 수 있는 삶의 순간들을 결에 새기면서 쌓여가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 나무의 나이테는 나이테라기 보다 소용돌이에 가깝다. 소용돌이는 새겨지는 삶이라기 보다 어지럽게 휘돌면서 몰아치는 삶이다. 젊은 나이의 삶은 새겨진 결이라기 보다 소용돌이에 더 가까울 것이다. 대패는 그 소용돌이 앞에서 나무를 깎아내지 못하고 시작부터 침몰하거나 “빽빽한 대팻밥에 날이 걸린다.” 젊은 죽음 앞에서 우리들 대부분은 무너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목이 메인다. 대패도 젊은 죽음 앞에선 우리와 똑같다.
시는 어린 나무의 죽음을 말하지만 그 죽음은 이태원에서 있었던 젊은 죽음들과 겹친다. 나무의 영혼에 닿던 대패질이 애도가 된 까닭일 것이다. 그 죽음 앞에서 목수는 더 이상 나무를 깎지 못한다. 대신 목수는 “세상의 옹이를 깎는/목수”가 된다. 아니 목수이면서 동시에 ‘투사’가 되고자 한다. 어린 나이에 느닷없이 죽은 그 나무에 세상이 박아놓은 옹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안전을 위해 마땅히 했어야할 일을 하지 않고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옹이가 될 것이다. 또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도 그 옹이의 하나일 것이다. 그 옹이를 깎아내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제 시인의 애도이다. 살다보면 ‘투사처럼’ 애도해야할 때가 있다. 시인 권상진이 그렇다고 한다.
(2023년 2월 3일)
(인용한 시는 『문예바다』, 2022, 겨울호에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