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날고 있어.
가끔 잔인한 일이지만
사실을 일러주어야 할 때가 있어.
넌 날고 있는게 아니야.
넌 매달려 있는 거야.
무슨 얘기야, 난 날고 있어.
그것도 두 팔을 활짝 펴고 날고 있어.
넌 날고 있는게 아니래두.
넌 공중에 걸쳐놓은 가는 줄에 매달려 있는 거야.
내가 날고 있다는데
왜 넌 내 말을 믿질 못해.
내가 줄에 매달려 있는 거라면
새들은 날개에 매달려 있는 거고,
너는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네 다리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날개가 새를 들어올리고
다리는 너를 싣고 다니지만
넌 한번도 새가 날개에 매달려있고,
네가 다리에 묶여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
내 등뒤의 가는 줄은 사실은 나의 날개야.
자꾸 네 눈을 그 줄에 묶어두지마.
네 눈이 그 줄에 묶이면
넌 영원히 내게서
하늘을 날고 있는
날개의 꿈을 볼 수 없을 거야.
할 말이 없다.
내가 말을 다 해 버려서 그래.
누군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그 다음 사람은 할 말이 없어져.
말이란 게 사실 혼자의 말 같아도
둘이 얘기를 나눌 때는 둘의 것이거든.
그 둘의 말은 말을 어떻게 주고 받느냐에 따라
말의 양이 적어질 때도 있고 많아질 때도 있어.
네가 내 말을 받았을 때
매달려 있다는 얘기로 네 얘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얘기는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몰라.
다음에 기회되면 얘기를 다시 시작해 보자.
그때도 난, 난, 날고 있어로 얘기를 시작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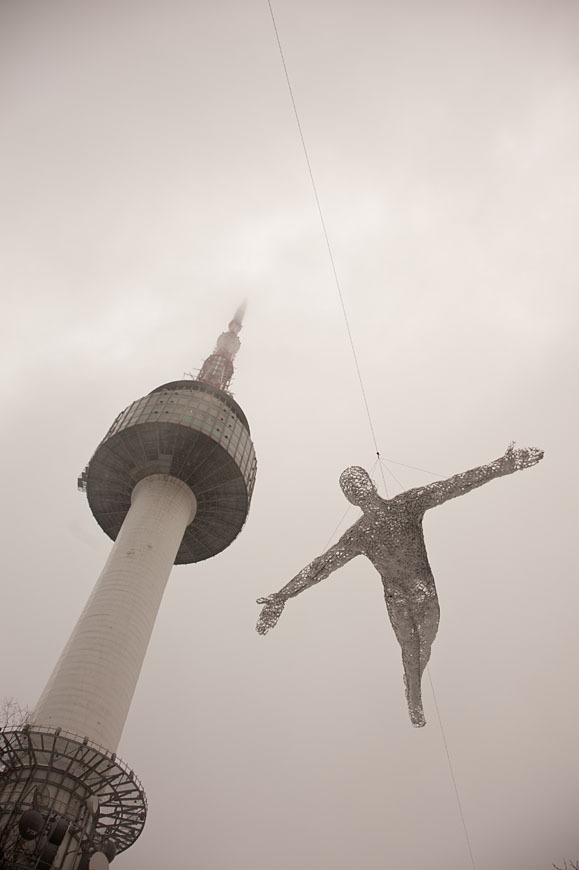
2 thoughts on “‘난다’는 것에 대하여”
날개가 새를 들어올리고
다리는 너를 싣고 다닌다.
발상이 참 재미있고 깊습니다.
조 날 눈이 내려서 사실은 저 사람 몸 속에 눈이 들어차 있었어요. 조 날은 정말 속살 깊숙이까지 시원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