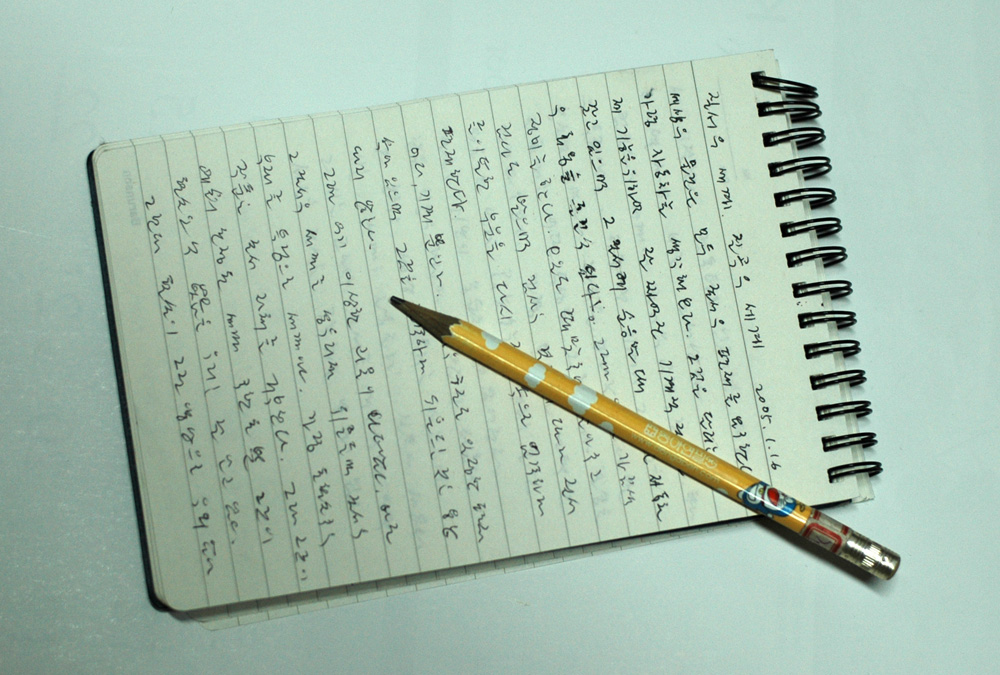가끔 나에게 있어 글을 쓴다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곤 한다.
그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글을 쓰게 되었느냐고 물어오면 우스게 소리로 들려주던 얘기가 떠오르곤 한다.
“원래는 글을 쓸 생각이 아니었어. 글은 나에게 있어 복수의 칼이었지. 원수를 갚으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나 할까. 왜 있잖아. 원수를 갚기 위해 칼을 열심히 가는 경우가. 그리고 사람들은 확실히 복수에 불탈 때 뭐든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열심히 칼을 갈았지. 그렇게 원래는 복수를 위해 칼을 갈고 있었는데 지나는 사람들이 가끔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한 거야. ‘칼을 상당히 잘 가는 구만.’ 그 얘기를 자꾸 듣다가 어느 날부터 복수 생각을 잊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는 밖으로 나서게 되었지. 이렇게 소리치며. ‘칼 갈어~’ 결국 복수를 꿈꾸며 칼을 갈다가 칼가는 게 직업이 되어버린 아주 이상한 경우가 내 경우라고나 할까.”
듣는 사람의 대부분은 웃고 지나가지만 사실 그 얘기는 내가 글을 쓰게 되면서 안게된 태생적 불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얘기이다.
그러니까 내 글은 그 시작의 걸음을 뗄 때 문학적 동류 의식을 나눌만한 지지기반과 같은 것을 전혀 꿈꾸지 않았으며, 아울러 나에겐 그러한 지지기반도 없었다. 그것은 복수를 꿈꾸던 것이었기에 오직 내가 갚아야할 원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그 초점을 잊어버리고 칼가는 일, 즉 글쓰는 일 자체에 빠져들고 말았다.
나에겐 그때부터가 문제였다. 아마도 처음부터 글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나는 그 길을 같이할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 길의 힘겨움을 어느 정도 나눌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글 자체에 목적이 없었던 나는 그러한 교류가 전혀 없었다. 그 때문에 나에겐 나의 주변에선 글에 대한 이해를 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 결과 나는 글을 쓰면서 세상과 만난 것이 아니라 글을 쓰면서 글 속으로 고립되고 말았다.
문제는 그 고립이 편안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의 그 고립된 정체성을 알아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 분은 어느 날 지나가는 말투이긴 했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던 번역일을 걱정하며, “자꾸 그런 일에 시간 뺏기면 안되는데”라고 말했다. 내가 들어본, 나의 글에 대한 유일한 걱정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글을 써서 살아가는 삶의 고달픔을 걱정했지만 그 분은 삶의 뒷전으로 밀리는 내 글을 걱정했다.
다음 달에 쓸 원고 때문에 오늘 시집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일상의 험악한 관계들에 부딪쳤다. 가끔씩 걸어주는 전화 한통의 미덕만 갖다 바치면 아무 탈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몸이 그 짓을 따르지 않아 생기는 잡음들이다. 글은 그렇게 때로 전화 한통의 위력에도 못미친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도 끓어오르는 분통 때문에 며칠 동안 일을 손에 잡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고립된 나의 공간, 바로 글의 공간으로 벽을 쌓고 내 세상으로 스스로 유폐의 시간을 가지며 몸을 고립시킨다. 그 은둔의 공간은 언제나처럼 오늘도 편안하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오늘은 글을 무기 삼아 그냥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얘기를 늘어놓다 보니 내가 갚으려고 했던 원수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원수는 멋지게 갚았다. 글의 위력을 실감한 순간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원수에게 미안한 감도 없지 않다.
이 엿같은 세상의 어느 구석에서 나를 비켜간 행운으로 인하여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