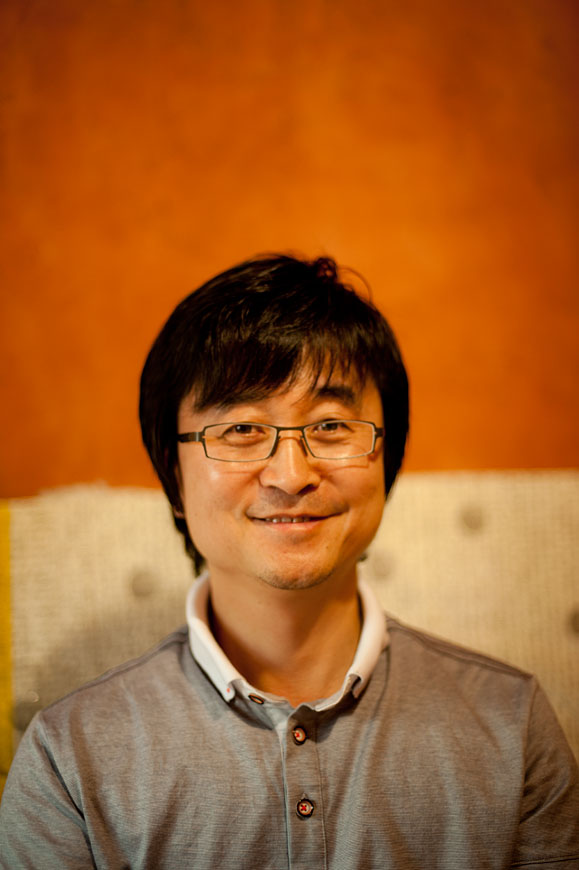그녀의 눈앞에 놓인 것은 진흙덩이였다.
아직 물기를 머금어 말랑말랑했다.
그녀가 손을 뻗고 그 손에 무게를 싣자
흙은 그녀의 무게를 제 품에 품었다.
그녀의 무게를 받아들인 자리가 안으로 들었고
때로 흙은 그녀의 손짓을 따라 바깥으로 솟기도 했다.
그리고 그 손길 끝에서 한 여자가 얼굴을 내밀고 그녀와 마주했다.
그녀는 흙속에서 한 여자를 불러냈다.
흙속의 그녀는 그녀에게 그녀의 가슴까지 내주었다.
그의 눈앞에 놓인 것은 거리의 양파 장사 아저씨였다.
장사를 하던 아저씨는 식사 시간이 되자
짜장면을 시켜서 식사를 한다.
시인이 그 풍경 속으로 시선을 들이민다.
아저씨가 입을 벌리고
짜장면을 한 젓가락 입에 넣을 때마다
시인의 시선에 아저씨의 입 속에서
입을 쩍쩍 벌리고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
네거리, 1톤 생계를 주차해 놓은 양파 장사 아저씨가
종이박스에 차려진 자장면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린다
젓가락 끝에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퍼뜩 아른거린다
아저씨의 아, 벌린 입 안에는 어느새
눈도 못 뜬 제비새끼처럼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이
입을 딱딱 벌린다.
한 입에 달린 세 입 식口들을 위해
아저씨는 입 안으로 부지런히 자장면을 배달시켜 준다
먹는 게 먹는 게 아니다
아, 아,
네거리, 쪼그려 앉아 자장면을 급하게 먹는
양파장사 아저씨의 먹먹한 먹먹한 입
—김주대, 「거리의 식사시간」 전문
그는 흔하게 만날 수 있어 너무도 일상적인 한 양파 장사 아저씨의 속에서
아저씨가 품고 다니는 그의 아이들을 불러냈다.
아저씨는 진흙덩이이다.
아직 물기를 머금어 말랑말랑한 진흙덩이이다.
아니 제 삶을 시인에게 진흙덩이로 내주는 사람이다.
시인은 시선을 팔처럼, 또 손처럼 뻗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가 시선을 뻗으면
진흙덩이 아저씨의 입 속에서
입을 딱딱 벌리는 아이들이 얼굴을 내밀고
시인과 얼굴을 마주한다.
도예가와 시인을 한자리에서 만나면
시는 글자로 불러내는 도예이고,
도예는 진흙덩이에서 불러내는 시이다.
두 사람과 어느 날의 오후 시간을 함께 보냈다.
사거리에서 직진하려는 옆차를 가로막으며 좌회전을 했다.
졸지에 앞으로 가려던 행로가 막힌 차들이 빵빵거린다.
운전을 하던 시인이 말했다.
“에이씨, 빵빵거리고 지랄이야.
내려서 한마디 해줄까.
우린 도예가를 태우고 있어.
너네, 도예가를 태워봤어?”
우리는 졸지에 차를 세우고 뒷차를 불러세운다.
그리고 계획에 없이 뒷차의 운전자에게 목소리를 높인다.
뒷차의 운전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온다.
“뭐, 도예가?”
내가 거든다.
“도예가 뿐인 줄 알어.
우린 시인이 운전하고 있어.
시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보기나 했어?”
운전자의 얼굴에서 어이없다는 말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표정이 역력하다.
“뭐야 이것들?”
우리는 싸움을 접는다.
“이게 이 동네 문제야.
도예가도 모르고, 시인도 모른다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냐.
우리 그냥 가자.”
상상 속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상상 속에서 곧바로 분란을 무마한 우리는
아무 일없이 길을 갔고
그 오후의 나머지 시간은
술에 취해 낄낄거리며 즐겁게 놀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