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은 회색빛으로 칠해져 있다.
마당을 덮은 넝쿨장미가 무성한 잎을 키워 그늘을 만들고
그 그늘을 벽에 얇게 덧입힌다.
벽의 회색빛에 약간의 짙은 농도가 더해진다.
지나가던 햇볕이
넝쿨장미 사이의 틈새로 작은 통로를 발견하곤
그곳으로 몸을 들이밀고 아래로 내려온다.
빛은 벽에 하얗게 줄을 그으며 지나간다.
나란히 두 줄이 발을 맞추고 있다.
벽에 낙서했다고 혼내주려다 그만두었다.
지켜보았더니 항상 저물 때쯤
그 낙서, 깨끗이 거두어갔던 기억이다.
바깥의 벽엔 사내 아이들이 남기고 간 낙서가 있다.
S로 시작해 X로 끝나는 예의 그 낙서이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 낙서를 한 것이 사내 녀석들이란 것을.
어릴 때, 그런 낙서를 하곤 낄낄거리는 것이 사내 녀석들이다.
앗, 요건 시인 진수미의 시에서 한구절을 빌려다
슬쩍 변주한 것이다.
사내 아이들은 내가 클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대로이다.
회색빛이 도포된 벽 위에 선명하게
낄낄거리는 낙서를 남긴다.
햇볕은 좀 다르다.
회색빛이 도포된 벽엔 낙서를 하는 법이 없다.
그저 그때는 벽 앞을 환하게 어른거리다 가는 것이 고작이다.
햇볕이 벽에 낙서를 하는 것은
벽에 그늘이 엷게 덧입혀져 벽의 색이 짙어 졌을 때 뿐이다.
그때서야 햇볕은 엷게 덧입혀진 그늘을 북 긋고 지나가며
하얗게 낙서를 남긴다.
녀석들, 흔적도 없이 거두어갈 수 없다면
그냥 햇볕처럼 벽 앞에서 어른거리다 갈 것이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내 녀석들은
덧입혀진 그늘 위를 긋고 지나가며 남겨놓고
또 흔적없이 거두어가는
햇볕의 낙서를 모른다.
나이가 들었나 보다.
녀석들의 낙서가 못마땅하고,
햇볕의 낙서만 마음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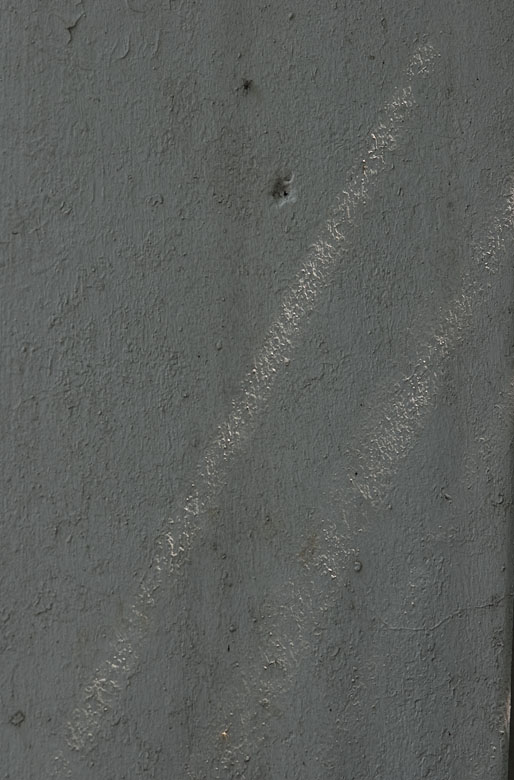
4 thoughts on “그늘과 빛”
기왕이면 어느 한 점에서 만나면 좋으련만
평행을 달린 흔적을 남겼네요.
그나마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이
여기인가 봅니다.
밑에 희미하게 또 한줄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장미가 한창 붉을 때는 햇볕이 마당에 내려와
동글동글 굴러다녔는데 그때 사진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시간나면 한번 뒤적거려 봐야 겠어요.
순하고, 소심하고, 착한 햇볕 녀석! ^^
그런 걸로 봐서는 녀석이 아닌 듯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