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 첫날의 오후를 양평의 한화리조트에서 보냈다.
막내 동생의 딸 지빈이와 놀다가 7시쯤 숙소를 나온 발길이
그만 한 걸음 두 걸음 옮겨지다
그 앞 옥산 자락의 범바위를 지나치고 말았다.
밤에 산길을 걸어 본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길은 호젓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곱시쯤 숙소를 나왔다.
여름이면 아직 훤했을 테지만
해가 짧은 겨울이라 바깥은 벌써 어두컴컴했다.
콘도 건물의 여기저기서 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론 부족했는지
바깥에 불을 별처럼 촘촘히 뿌려놓고 있었다.
불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모자라 온통 여기저기 불을 뿌려놓고
잠시 그 불에 시선을 빼앗겨가며 사는 세상이다.
산책로로 건너가는 다리 위에서 보니
그 아래 계곡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얼음은 꺼지지 않는 물이다.
그래서 신기하다.
아이들은 그 위를 구르거나 혹은 미끄러지면서
그 신기함을 즐긴다.
계곡은 물이 얼어붙어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얼음에 덮인 계곡은 원래 말없는 침묵으로 조용한 법이지만
오늘은 그 위에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가득했다.
아이들은 곧 내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아이들의 소리는 한참 동안 내 뒤를 졸졸 따라왔다.
아이들의 소리를 뿌리치는 데는 한참이 걸렸다.
산책로 곳곳에 조각품들이 서 있었다.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에 멈칫했다.
그러다 곧 익숙해져 잠시 긴장에 쌓였던 마음을 풀어놓았다.
그리고 그 길에서 이 여인을 만났다.
평상시엔 금속성 시선으로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을 여인이
오늘은 눈 속에 하얀 눈을 채우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산책로에서 또 한 여인을 만났다.
이 여인에게선 표정을 읽어낼 수 없었다.
다만 머리에 왕관처럼 얹혀진 눈이 이제는 속절없이 주저 앉으면서
화려했던 시절을 돌아보는 듯 보였다.
산책로를 따라 조금 더 올라가자
나무들이 콘도 건물과 키재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눈덮인 다리 하나를 건넜다.
나무로 된 그 다리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웅우웅 울었다.
다리는 왜 우는 것일까.
체온이 그리운 시절이니
발끝의 체중에 실려 전해진 작은 온기로
그 그리움이 도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산책로엔 여기 저기에 시들이 놓여있었다.
손전등을 들이밀었더니
전등빛은 어둠을 밝혀준 것이 아니라
어둠을 칼처럼 깊게 찔렀다.
그 빛의 칼로 어둠의 꺼풀을 벗겨내면서 시 한편을 읽었다.
조금 아래쪽에서 나무와 키재기 놀이를 했던 콘도 건물이
이제는 완전히 나무들의 뒤로 묻혔다.
그러나 나무들 사이의 듬성듬성한 틈새로 여전히 빛이 새고 있었다.
어둠이 짙어 망설이다가 손전등에 의지에 계속 옮겨놓은 걸음이
결국은 범바위에 이르렀다.
호랑이가 앉았음직한 넓직한 바위였지만
바위는 찍지 못하고 대신 그 앞의 표지판만 찍었다.
범바위에 이른 내 걸음은 그곳에서 걸음을 되돌리지 않고
토끼봉쪽으로 계속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뽀득뽀득 눈을 밟으며 그 길을 가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잎을 털어낸 나무들이 하늘로 실핏줄처럼 번져 있었다.
나무에 기대 산길의 사진 한장을 찍는다.
요즘의 카메라는 참 대단하다.
불없이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길을
마치 적외선 촬영이라도 하듯 환하게 찍어낸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작은 빛의 알갱이들이 떠다니고 있다는 소리이다.
올라가다 보니 잠시 사라졌던 한화 콘도 건물이 다시 나타났다.
건물은 빛을 밝히고 있다기보다
거의 빛에 물들어 있었다.
내 앞의 나무들은 모두 빛을 버리고
진한 어둠에 물들어 있었다.
산 위쪽으로 올려다 보니 산이 멀리 윤곽을 그리며
가장 높은 봉우리가 어느 쪽인지를 일러준다.
생각 같아서는 멀리 보이는 봉우리까지 가보고 싶었다.
그러나 봉우리는 너무 아득해 보였다.
밤엔 같은 거리도 더욱 아득해진다.
갑자기 길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달리하고 있었다.
여기가 토끼봉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다.
그냥 난 사진 한 장 찍고 이제 다시 내려가기로 했다.
어둠이 짙어 카메라가 초점을 잘 잡아내지 못했다.
내 카메라는 니콘이라
아무리 어두워도 보조광이 나와 초점은 정확하게 잡아낸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아예 셔터가 눌러지질 않는다.
그런데 이틀 동안 어떤 경우에도 일단 사진을 찍도록
초점 모드가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
그 바람에 그만 몇 장의 사진에서 초점이 빗나가고 말았다.
이 사진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래도 쌓아놓은 돌을 이곳에 왔다는 징표삼아 찍었다.
북쪽으로 높은 산이 하나 나무들 사이에서 윤곽을 그리고 있었다.
중미산이 아닌가 싶다.
산은 완전히 어둠에 쌓여있다.
하지만 가끔 그 산의 중턱으로 불빛이 지나갔다.
자동차 불빛이다.
밤의 자동차는 길을 가며
자신이 더듬는 불빛으로 그곳이 길임을 알려준다.
눈덮인 산은 내려가는 걸음이 더욱 조심스럽다.
평탄한 구간도 있었지만 가파른 구간도 있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운 것은 어깨에 둘러맨 카메라 때문이다.
내려가는 길은 나보다 카메라가 더 소중해지는 슬픈 길이기도 하다.
내 몸보다 기계가 더 소중해지는데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기계보다도 못한 몸의 시대라니.
아마 카메라가 없었다면 발걸음은 그렇게 조심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갑자기 뒤쪽에서 부스럭하는 소리가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한다.
돌아보면 길이 미끄러워 내가 잡았다 놓은 나무에서
갈잎이 대책없이 몸을 흔들며 내고 있는 소리이다.
밤엔 내가 만들어낸 소리에 내가 놀란다.
다 내려왔을 때쯤 산책로 입구에서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을 만났다.
두 사람은 어둠이 시커멓게 집어삼킨 산책로를 한참 바라보다 걸음을 되돌렸다.
어둠이 길을 삼키면 누구나 그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들어설 엄두를 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손전등으로 그 길을 조금씩 벗겨내며 길을 가보면
그 길은 길을 걷는 자에게 혼자만의 호젓함을 주는
남다른 맛의 길이 되기도 한다.
설악산이나 대관령과 달리 어둠이 그렇게 진하지는 않았다.
몇 번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있기까지 했다.
설악산이나 대관령에선 불을 끄면
그 자리의 내가 까맣게 지워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둠이 진했었다.
서울 인근에다 리조트 건물이 턱밑에 있어서 그런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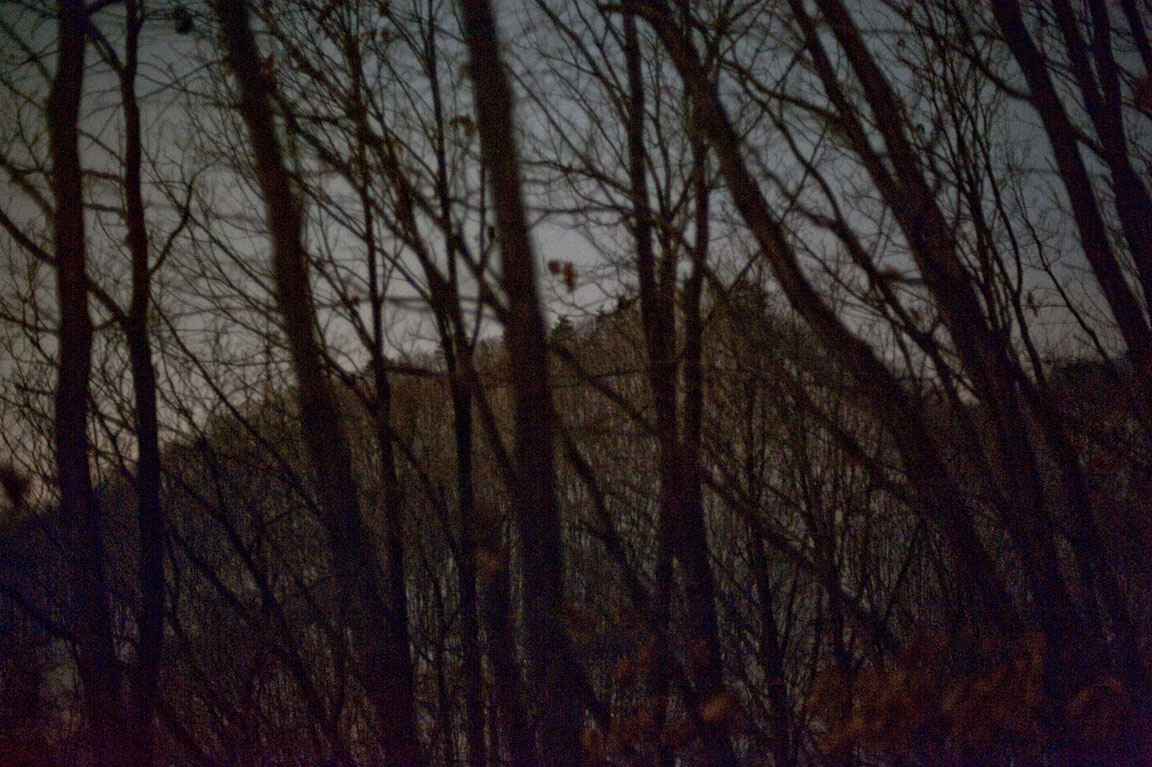





6 thoughts on “양평 옥산 자락의 범바위”
한국에서 리조트 가본지는 용평에 초등학교때 가본후에 없는데,
나중에 집사람하고 애기 데리고 가봐야겠네요.
한국은 많이 춥다는데, 건강한 한해 보내세요~
저는 가족들과 갈 때는 주로 이런 곳을 이용해요.
동생들이 이런 데로 숙소를 잡거든요.
주변의 등산로가 잘되어 있어서 그건 아주 좋더라구요.
갈 때마다 아침 일찍 혼자 등산을 하거든요.
정님, 올해 예쁜 아기와 함께 새롭게 열리는 한해가 되세요.
새벽에 동원님 글 읽고 필 받아 새벽 산행 다녀왔습니다.^^
턱밑의 검단산은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새벽에 길떠난 것이 언제였나 싶습니다. 오대산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두 해전의 일이군요. 올해는 다시 새벽에 산으로 나서는 걸음을 한번 마련해야 겠습니다.
아니… 아직 돌아오신 건 아닐테고…..
서…설마…… 그 놋북을 들고 가신건가요?ㅋㅋㅋ
서울에 안 계시면 신데렐라 블로그의 화면이 어떻게 바꼈나 하는 게 유난히 더 궁금해져요. 쥔장이 안 계신데도 12시만 되면 착착 메인화면의 글이 바껴주는게 ‘이 블로그는 이제 자동이 됐구먼’ 싶거든요.
저 산책길 저는 여름날, 환한 볕에, 션하게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둠을 칼처럼 깊게 찔러 베어버린 손전등…. 대단하세요!
그 놋북 가져갔으면 여지껏 있었을 텐데 놋북이 없어서 하룻밤 자고 올라왔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인터넷이 안되더라구요.
밤에 혼자 걸은데다 눈길이라 모든 것이 많이 새로웠어요.